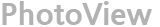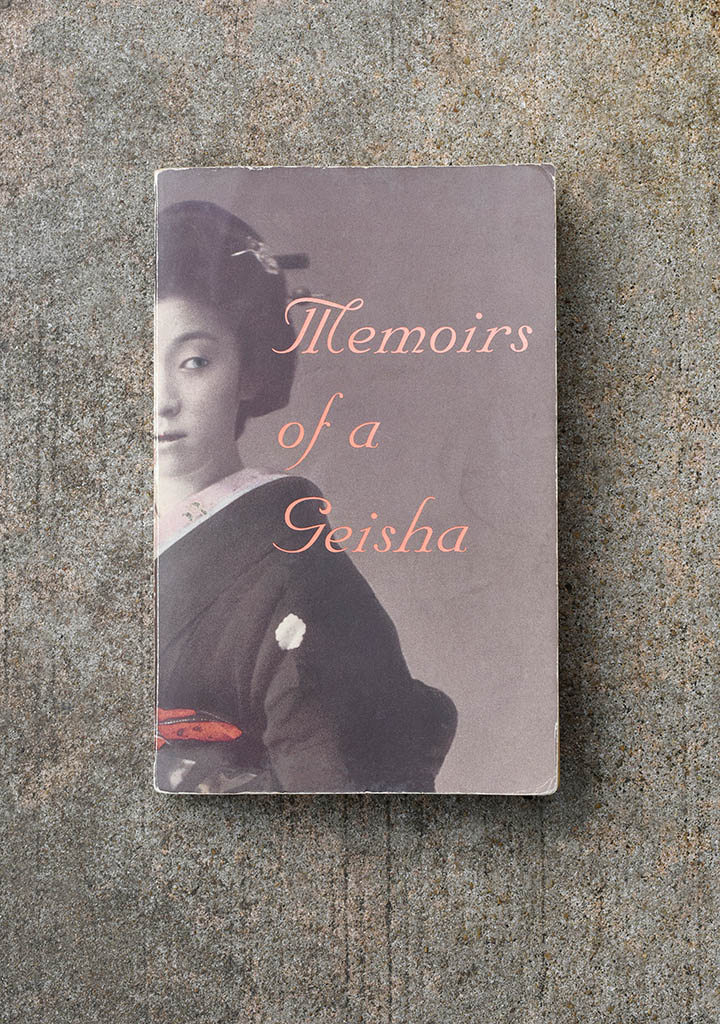고정남(高正男)은 전남 장흥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디자인전공,
도쿄종합사진전문학교와 도쿄공예대학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였다.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은 주로 건축, 인쇄 매체(printed media), 한국적 현상이다.
2002년 첫 개인전 「집. 동경이야기」를 시작으로 10여 차례 개인전을 진행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 상지영서대학 강사를 거쳐 부천대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7.05.13 18:57
Honam Line - Song of Arirang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서대전에서 목포까지 261.5Km를 잇는 호남선 본선은 1914년 일제가 호남지방 곡물을 쉽게 수탈 위해 만든 철도이다. 나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전남 어촌에서 자라 철도문화를 몰랐지만, 적산가옥(敵産家屋)은 보고 자랐다. 일본유학 시절 도쿄에서 본 오래된 일본가옥이 놀랍게도 고향 장흥에서 보던 집의 모습과 같았다. 첫 개인전 「집. 동경 이야기」(2002년)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작업 <호남선>은 익산-김제-군산-정읍-영산포-목포 모습을 사진에 담은 것이다. 작가의 표현은 결국 삶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2011년부터 사진 강사로 전국을 떠돌면서 촬영한 것이다. 수확기에 접어든 전북 김제 광활면의 노란 벼가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 농로를 따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걸었다. 논 옆 수로에는 물이 흐르
고 논을 가득 메운 까마귀떼로 김제평야는 빈센트 반 고흐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 <까마귀가 나는 밀밭>과 겹쳐졌다. “성난 하늘과 거대한 밀밭, 불길한 까마귀 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세 갈래 갈림길의 전경에서 강한 절망감을 느낀다.”는 고흐의 말처럼 음산했다. 고흐는 밀밭에 반사된 강렬한 노란색과 가로로 긴 캔버스를 사용해 밀밭의 광활함을 강조했는데 나의 이번 작업에서도 그 프레임과 몇 개의 오브제를 차용하였다. 얼핏 보기에 호남선 주변 풍경은 소박하고 고요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마을 곳곳에 한 세기가 지난 일제강점기 가옥과 곡물 창고들이 덧없이 남아 뚜렷하게 기억하게 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막막함과 절망이 서려 있는 역사적 장소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다 보니 우리 시대의 삶과 저항의 자리마다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쌀쌀한 풍경’보다 더한 침묵의 항거이다.
2017. 3.고정남
서대전에서 목포까지 261.5Km를 잇는 호남선 본선은 1914년 일제가 호남지방 곡물을 쉽게 수탈 위해 만든 철도이다. 나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전남 어촌에서 자라 철도문화를 몰랐지만, 적산가옥(敵産家屋)은 보고 자랐다. 일본유학 시절 도쿄에서 본 오래된 일본가옥이 놀랍게도 고향 장흥에서 보던 집의 모습과 같았다. 첫 개인전 「집. 동경 이야기」(2002년)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작업 <호남선>은 익산-김제-군산-정읍-영산포-목포 모습을 사진에 담은 것이다. 작가의 표현은 결국 삶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2011년부터 사진 강사로 전국을 떠돌면서 촬영한 것이다. 수확기에 접어든 전북 김제 광활면의 노란 벼가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 농로를 따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걸었다. 논 옆 수로에는 물이 흐르고 논을 가득 메운 까마귀떼로 김제평야는 빈센트 반 고흐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 <까마귀가 나는 밀밭>과 겹쳐졌다. “성난 하늘과 거대한 밀밭, 불길한 까마귀 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세 갈래 갈림길의 전경에서 강한 절망감을 느낀다.”는 고흐의 말처럼 음산했다. 고흐는 밀밭에 반사된 강렬한 노란색과 가로로 긴 캔버스를 사용해 밀밭의 광활함을 강조했는데 나의 이번 작업에서도 그 프레임과 몇 개의 오브제를 차용하였다. 얼핏 보기에 호남선 주변 풍경은 소박하고 고요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마을 곳곳에 한 세기가 지난 일제강점기 가옥과 곡물 창고들이 덧없이 남아 뚜렷하게 기억하게 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막막함과 절망이 서려 있는 역사적 장소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다 보니 우리 시대의 삶과 저항의 자리마다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쌀쌀한 풍경’보다 더한 침묵의 항거이다.
2017. 3.
고정남
이번 작업 <호남선>은 익산-김제-군산-정읍-영산포-목포 모습을 사진에 담은 것이다. 작가의 표현은 결국 삶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2011년부터 사진 강사로 전국을 떠돌면서 촬영한 것이다. 수확기에 접어든 전북 김제 광활면의 노란 벼가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 농로를 따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걸었다. 논 옆 수로에는 물이 흐르고 논을 가득 메운 까마귀떼로 김제평야는 빈센트 반 고흐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 <까마귀가 나는 밀밭>과 겹쳐졌다. “성난 하늘과 거대한 밀밭, 불길한 까마귀 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세 갈래 갈림길의 전경에서 강한 절망감을 느낀다.”는 고흐의 말처럼 음산했다. 고흐는 밀밭에 반사된 강렬한 노란색과 가로로 긴 캔버스를 사용해 밀밭의 광활함을 강조했는데 나의 이번 작업에서도 그 프레임과 몇 개의 오브제를 차용하였다. 얼핏 보기에 호남선 주변 풍경은 소박하고 고요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마을 곳곳에 한 세기가 지난 일제강점기 가옥과 곡물 창고들이 덧없이 남아 뚜렷하게 기억하게 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막막함과 절망이 서려 있는 역사적 장소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다 보니 우리 시대의 삶과 저항의 자리마다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쌀쌀한 풍경’보다 더한 침묵의 항거이다.
2017. 3.
고정남
오래된 풍경, 사유의 이미지
최연하 전시기획자
사진, 여행, 산보, 수집
이 사진집은 1921년도에 일제가 제작한 한 장의 지도로부터 시작되어 잘 익은 벼 이삭 한 줄기가 찍힌 사진으로 끝을 맺는다. 철도 노선도가 그려진 지도에는 한반도와 대만에 굵고 붉은 선분이 해안가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와 함께 사진집의 중반에는 다시 1970년도에 제작된 지도를 펼쳐든 사내들이 보인다. 간혹 사람들이 주제로, 배경으로 찍힌 사진들도 있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사진이 반복해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기도 하고, 사물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풍경과 사람, 건물과 사물이 교차하면서 한 권의 사진책이 된 고정남의 『호남선』은 착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파편적인 이미지들, 맥락이 없어 보이는 오브제와 풍경은 친절한 서사를 기대했던 독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고 당혹감을 안겨줄 것이다. 거기에 대개의 사진들이 심심하고 단순하고 심지어 구도가 삐딱하게 치우쳐 있어서 작가의 의도를 캐내기란 여간 심난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사진인 ‘지도’가 없었다면 이 책을 볼 때 어떤 노선을 경유해야 할지 난해하기만 하다.
고정남은 『호남선』에서 하나의 루트를 제시하지 않는다. 사진가, 여행자, 산보객, 수집가로서의 다양한 그의 역할만큼이나 이 사진집에는 간혹 그의 여정을 알 수 있는 표식이 등장하고, 여행지에서 만났던 풍경과 건물과 사람들, 그리고 산보를 하며 수집했던 사물들이 각각의 사연을 안고 있기에, 사진집은 순차적으로 넘기며 봐야겠지만 책을 덮고 난 후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이어가며 별자리를 헤아리듯, 다시 눈을 감고 사진-지도를 만들어야 사진집 ‘읽기’의 여정을 비로소 마칠 수 있다. 고정남은 언제나 동인천의 집에서 출발하여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호남선’이 닿는 마을들을 순서 없이 찾아가 며칠씩 머물며 사진을 촬영한 후에 다시 집으로 오는 것으로 여정을 마친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영토를 끊임없이 떠났다! 그 길 위에서, 당도한 마을 안에서,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서, 혹은 땅에 바짝 엎드려 찍어낸 사진들은 대부분 소소하지만 기념비적인 것이다. 수집가로서 고정남의 각별한 취향은 바로 ‘소소한데 기념비적인 것’을 발굴하는데 있다. 수집한 오브제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예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키득대며 바라봤을 것이다. 여행자로서 고정남이 찍은 사진들은 별다른 목적도 의도도 없어 보인다. 크게 고생하고 고뇌에 차서 찍은 사진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촬영을 위해 되도록 느리게 걷고, 한 장소에 오래도록 머물며 배회하고, 이미 사라진 풍경이나 사라지기 시작한 풍경 앞에서 쩔쩔맸을 표정도 그려진다. 세계의 혼돈 자체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경쾌하고 얽매임 없는 이 사진가의 몸짓은 언제나 엄격한 절제미를 기본으로 하기에, 그의 사진은 다루기 어려운 유리조각 같았다. 고정남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진으로 읊조린 [Song of Arirang]연작이 유리 파편처럼 투명하고 민감한 것은 ‘아리랑’이라는 제도적이고 선험적인 인식틀이 논리적 질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고정남 특유의 형상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어로 잘 환원되지 않는 이 이미지의 질서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Song of Arirang - 호남선]연작 또한 해석하려는 욕망 앞에서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배회하면서 언어의 권능을 일정 정도 포기해야하는 과제를 안겨줄 뿐이다.
흔들리는 시선, 희미한 사진
주지하다시피 고정남이 일본 유학 후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한 [Song of Arirang]연작은 ‘아리랑’에 의해 촉발된 감각과 관심으로 이뤄진 상징적 의미공간이자 작가의 내부에 깃들인 존재의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사진을 촬영하는 일은, 작가의 마음속에 들어온 외부의 풍경을 사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가는 길에 다름 아니고, 풍경을 이상화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풍경의 진실을 표상하는 일이다.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이 예술을 자기인식을 가능케 하는 성찰의 매개로 삼았듯이 그에게 풍경은 내/외부의 프레임이 혼융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 엄밀한 관찰이었을 것이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띈 풍경이 바로 곳곳에 남아 있는 적산가옥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미학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작가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구성하는 일종의 영상적 구축물이 된다. 사진에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이 있고, 저마다 자기의 사유, 경험에 따라 리얼리티는 다르게 정의 내려질 수 있다. 『호남선』은 고정남의 지각과 경험이 독자적으로 조직되어 주체의 인식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호남선’을 따라가는 고정남의 시각은 일정하게 틀 지워지지 않고 흔들린다. 물리적인 시점이 다양하고, 계절과 장소도 다르다. 때로는 기차 안에서 창밖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가 하면, 군산 어디쯤에 위치한 역사(驛舍)는 한 낮의 태양아래 파사드(fasade)를 무료하게 내보이고, 어떤 적산가옥은 세부가 낱낱이 드러나 더 이상 보기를 멈추게 한다. 사진의 배경이자 주제가 되는 풍경의 관계에서 서사가 파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3차원의 공간이 2차원의 평면으로 번역되면서 프레이밍 될 수밖에 없는 사진도 있다. 광활한 호남평야가 형태가 사라지고 색으로만 제시될 때는 작가가 풍경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대지의 호흡에 일체되는 일종의 의식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작가의 양가적인 시각이 교차하는 사진들도 있는데, 제국적인 시각과 비제국적인 시각이 양립할 때이다. 여기에는 이중의 판타지가 작동하는데, 정복의 대상이 된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싸주어야 할 연민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것이다. 일제의 식민지가 된 풍경과 삶의 터전으로서 고국을 바라보는 시선, 식민지의 기억을 안고 제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다시 바라본 고국의 산천은 서로에게 데쟈뷰이자 서로의 프레임이기도 하다. 이 두 개의 프레임은 간혹 고정남의 사진에서 격자(格子)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 함정에서 벗어나 다른 풍경을 생산해내기 위해 이제까지 알고, 봐왔던 것들을 지우려는 노력도 보이기도 한다. 그의 사진이 심심하고 단순해지는 지점이 바로 이 함정에서 자유로워지려는 고정남만의 경쾌한 프레임이 형성될 때이다. 사진가-주체의 일방적인 시선을 거두고, 풍경(대상)과 시선을 나누고 공명하려고 할 때 생성되는 새로운 차원인데,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무언가를 점령한다는 소유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어쩌면 이를 포기할 때 겨우 획득되어지는 희미한 욕망-긴장감 같은 것이다. 이처럼 고정남의 사진이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미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이 표상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산되는 삶일 뿐이다. 그저 살아지는 삶처럼 살아나는 예술. 추하지도 아름답지도 않게 일부러 예술화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것 같은 사진들. 버려진 것들과 파편적인 자료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모자이크처럼 조직된 호남선의 얼굴을 다만 제시할 뿐이다. 고정남의 이러한 전략은 기왕에 존재하는 ‘사진읽기’의 방법의 치명적 결락을 보여준다. 특정 시대의 역사를 일종의 암호로 제시하며, 도식과 체계를 거부하는 사유의 이미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