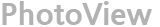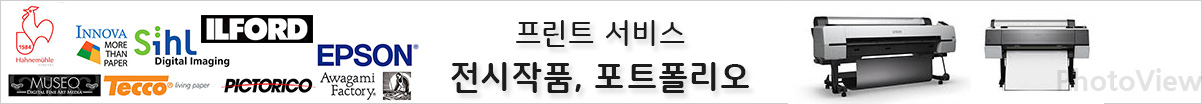서울, 종로, 명동 그리고 이 도시 저 도시의 무수한 골목길 - 고작 카메라 한대 둘러매고 도시를 배회하던 사냥꾼은 어둠이 내리는 어스름 녘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밝은 동네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선다. 서서 먹는 대포 집에서 국수 한 그릇, 막걸리 한잔으로 하루의 피곤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일깨운다. 오직 가난한 가슴으로 만나야 했던 그 시절, 그 도시 _ 하얗게 오버랩 되는 아련한 불빛, 그 소리, 그 냄새들에서 스쳐 지나간 그곳, 그대들의 향취. 집으로 가는 길, 싸늘한 도시 한 켠에 따스하게 반짝이던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들이 내가 살던 달동네에도, 단칸방에도 빛나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1985부터 1990년 까지 약 5년 정도 촬영된 것이다.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들) 사진집을 보고 내가 받은 감동 때문이었다. 1958년에 출판된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개인적, 보편적 진실의 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해야 할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고, 보고, 느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느끼는 객관적 시각이 아닌 나라는 개인의 주관적 시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 시대의 현상들, 정치, 경제, 문화,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현실들을 보도하거나 증언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느낌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러나 내 작업 또한 (미국인들)이 그러했듯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한 시대의 보편적 진실이 ‘나’라는 매체를 통과하며 사진 속에 담길 것이라 확신했다.
젊은 날 고향을 떠나 서울과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느끼게 된 전반적 생각은 나와 그리고 처지가 비슷한 사회적 약자와 빈곤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현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땅이 아니라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남들 같은 ‘타인의 땅’ 임을 느꼈다. 2013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땅에 있는가?
그 때에 써두었던 작가노트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타인의 땅, 우리들의 땅
할수록 어려운 것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조금 안다고 느끼게 되면서 더욱 막막하고, 더욱 괴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무엇이며, ‘시대의 현실’ 이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어떻게 아픔 없이 해명하며, 극복할 수 있을까? 철학은 긴 사설만 늘어놓고, 예술은 시끄럽게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나에겐 꿈속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문 밖의 소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타인의 땅’ 에서 뜻을 잃고 오고가는 나그네들이 아닐까요? 정말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나의 피부를 쓰라리도록 하는 사진은 무엇인지? 이 번민이 계속되는 한 나의 사진은 방황을 멈추는 날까지 계속되는 숙명이겠지요.
타인이 훨씬 많다
옛날은 가지 않는다. 옛날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불현듯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다. 옛날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이야기, 우리가 옛날에게 하는 답변은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의식하는 ‘나’의 일치 여부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좌우한다. 이 세 요소가 일치될 때 인간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시간, 장소, ‘나’가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금언의 발설자가 대부분 인류의 교사라는 사실을 환기한다면, ‘나’와 시간, ‘나’와 장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시간의 무질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의 개입과 간섭이 도를 넘으면 탈이 난다.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과거 또는 미래가 현재를 장악하면 위험해진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체가 서로 조화로운 삼각형을 이룰 때, 지금-여기가 길고 넓어진다.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통제할 때,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이 성찰하고 전망하는 능력과 서로 손을 잡을 때 내가, 우리가 온전해진다. 『타인의 땅』에 대한 이 짧은 글은 시간-기억에 대한 짧은 명상이다. 30여 년 전 이갑철의 카메라가 포착한 시간과 장소(1988년 동명의 전시회가 열렸고, 그때 얇은 도록이 나온 적이 있다)를 통해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양 옆을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의 앞을 내다보자는 의도다.
『타인의 땅』은 묻는다. 누가 타인인가. 어디가 타인의 땅인가. 타인의 땅에 사는 자는 또 누구인가. 『타인의 땅』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벽화이자 그 시대를 살아낸 한국인의 초상이다. 그렇다면 타인은 누구인가. 타인을 군사정권이나 외세, 기득권층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전개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를 배경으로 하면, 그 시절을 살아낸 대다수 사람들에게 ‘타인의 땅’은 집단 무의식이다. 지난 세기 한국인은 고향 상실이라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공유했다. 고향을 떠난 청춘들, 고향을 등진 가장들이 깃들 수 있는 도시는 도시의 변두리였다. 도시, 도시의 일터, 도시의 셋방이 모두 타인의 땅이었다. 타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디아스포라의 삶이다. 타의에 의해 고향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고단한 디아스포라의 후예가 지금 독거청년이 되어 옥탑방과 고시원, 원룸을 전전하고 있다. 지난 30년 사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타인이고, 곳곳이 타인의 땅이 되고 말았다.
『타인의 땅』으로부터 삼십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를 지배하는 타인-초자아는 ‘폭력적 아버지’에서 ‘경제적 아버지’로 바뀌었다. 타인의 땅은 기업-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우리는 타인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개의 탈을 써야 했다. 그러는 사이 타인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다. 타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급기야 타인이 된 것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승자독식이 들어섰다.
『타인의 땅』은 묻는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삼십 년 사이,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또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갑철 사진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수전 손택은 “사진이 지닌 최고의 소명은 인간에게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사진은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확인해줄 뿐”이라고 말했다. 침묵하는 사진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독자의 상상력이다. 독자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사진을 자신의 삶 속에 편입시킨다. 나아가 사진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 위에 위치시킨다. 우리는 사진 앞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사진가다. 사진의 진정한 서식지는 사진 설명, 즉 독자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타인의 땅』은 빛바랜 앨범이 아니다. 사진집에 들어 있는 흑백사진은 지금-여기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1980년대가 시간의 지층 아래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저 1980년대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인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을 타인으로 규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과 권력의 그늘에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내 주위의 갑남을녀, 즉 우리 사회의 99%를 ‘진정한 타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타인의 의미를 전복시키고 타인을 이웃으로 영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타인을 지인(知人)으로 거듭나게 하는 비결은 따로 없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즉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은 우리 독자의 몫이다. 사진설명, 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우리가 사진 앞에서 저마다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타인을 ‘지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땅을 ‘우리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사진 앞에서, 작품 앞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의 유일한 능력이다.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자. 옆에 있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자. 내가 먼저, 타인의 타인이 되자. 타인의 손을 잡고 이 드넓은 타인의 땅 위에 굳건하게 서자.
시인 이문재
옛날은 가지 않는다. 옛날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불현듯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다. 옛날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이야기, 우리가 옛날에게 하는 답변은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의식하는 ‘나’의 일치 여부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좌우한다. 이 세 요소가 일치될 때 인간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시간, 장소, ‘나’가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금언의 발설자가 대부분 인류의 교사라는 사실을 환기한다면, ‘나’와 시간, ‘나’와 장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시간의 무질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의 개입과 간섭이 도를 넘으면 탈이 난다.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과거 또는 미래가 현재를 장악하면 위험해진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체가 서로 조화로운 삼각형을 이룰 때, 지금-여기가 길고 넓어진다.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통제할 때,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이 성찰하고 전망하는 능력과 서로 손을 잡을 때 내가, 우리가 온전해진다. 『타인의 땅』에 대한 이 짧은 글은 시간-기억에 대한 짧은 명상이다. 30여 년 전 이갑철의 카메라가 포착한 시간과 장소(1988년 동명의 전시회가 열렸고, 그때 얇은 도록이 나온 적이 있다)를 통해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양 옆을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의 앞을 내다보자는 의도다.
『타인의 땅』은 묻는다. 누가 타인인가. 어디가 타인의 땅인가. 타인의 땅에 사는 자는 또 누구인가. 『타인의 땅』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벽화이자 그 시대를 살아낸 한국인의 초상이다. 그렇다면 타인은 누구인가. 타인을 군사정권이나 외세, 기득권층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전개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를 배경으로 하면, 그 시절을 살아낸 대다수 사람들에게 ‘타인의 땅’은 집단 무의식이다. 지난 세기 한국인은 고향 상실이라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공유했다. 고향을 떠난 청춘들, 고향을 등진 가장들이 깃들 수 있는 도시는 도시의 변두리였다. 도시, 도시의 일터, 도시의 셋방이 모두 타인의 땅이었다. 타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디아스포라의 삶이다. 타의에 의해 고향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고단한 디아스포라의 후예가 지금 독거청년이 되어 옥탑방과 고시원, 원룸을 전전하고 있다. 지난 30년 사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타인이고, 곳곳이 타인의 땅이 되고 말았다.
『타인의 땅』으로부터 삼십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를 지배하는 타인-초자아는 ‘폭력적 아버지’에서 ‘경제적 아버지’로 바뀌었다. 타인의 땅은 기업-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우리는 타인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개의 탈을 써야 했다. 그러는 사이 타인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다. 타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급기야 타인이 된 것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승자독식이 들어섰다.
『타인의 땅』은 묻는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삼십 년 사이,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또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갑철 사진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수전 손택은 “사진이 지닌 최고의 소명은 인간에게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사진은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확인해줄 뿐”이라고 말했다. 침묵하는 사진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독자의 상상력이다. 독자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사진을 자신의 삶 속에 편입시킨다. 나아가 사진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 위에 위치시킨다. 우리는 사진 앞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사진가다. 사진의 진정한 서식지는 사진 설명, 즉 독자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타인의 땅』은 빛바랜 앨범이 아니다. 사진집에 들어 있는 흑백사진은 지금-여기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1980년대가 시간의 지층 아래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저 1980년대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인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을 타인으로 규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과 권력의 그늘에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내 주위의 갑남을녀, 즉 우리 사회의 99%를 ‘진정한 타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타인의 의미를 전복시키고 타인을 이웃으로 영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타인을 지인(知人)으로 거듭나게 하는 비결은 따로 없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즉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은 우리 독자의 몫이다. 사진설명, 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우리가 사진 앞에서 저마다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타인을 ‘지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땅을 ‘우리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사진 앞에서, 작품 앞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의 유일한 능력이다.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자. 옆에 있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자. 내가 먼저, 타인의 타인이 되자. 타인의 손을 잡고 이 드넓은 타인의 땅 위에 굳건하게 서자.
시인 이문재
서울, 종로, 명동 그리고 이 도시 저 도시의 무수한 골목길 - 고작 카메라 한대 둘러매고 도시를 배회하던 사냥꾼은 어둠이 내리는 어스름 녘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밝은 동네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선다. 서서 먹는 대포 집에서 국수 한 그릇, 막걸리 한잔으로 하루의 피곤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일깨운다. 오직 가난한 가슴으로 만나야 했던 그 시절, 그 도시 _ 하얗게 오버랩 되는 아련한 불빛, 그 소리, 그 냄새들에서 스쳐 지나간 그곳, 그대들의 향취. 집으로 가는 길, 싸늘한 도시 한 켠에 따스하게 반짝이던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들이 내가 살던 달동네에도, 단칸방에도 빛나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1985부터 1990년 까지 약 5년 정도 촬영된 것이다.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들) 사진집을 보고 내가 받은 감동 때문이었다. 1958년에 출판된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개인적, 보편적 진실의 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해야 할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고, 보고, 느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느끼는 객관적 시각이 아닌 나라는 개인의 주관적 시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 시대의 현상들, 정치, 경제, 문화,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현실들을 보도하거나 증언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느낌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러나 내 작업 또한 (미국인들)이 그러했듯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한 시대의 보편적 진실이 ‘나’라는 매체를 통과하며 사진 속에 담길 것이라 확신했다.
젊은 날 고향을 떠나 서울과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느끼게 된 전반적 생각은 나와 그리고 처지가 비슷한 사회적 약자와 빈곤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현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땅이 아니라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남들 같은 ‘타인의 땅’ 임을 느꼈다. 2013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땅에 있는가?
그 때에 써두었던 작가노트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타인의 땅, 우리들의 땅
할수록 어려운 것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조금 안다고 느끼게 되면서 더욱 막막하고, 더욱 괴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무엇이며, ‘시대의 현실’ 이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어떻게 아픔 없이 해명하며, 극복할 수 있을까? 철학은 긴 사설만 늘어놓고, 예술은 시끄럽게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나에겐 꿈속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문 밖의 소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타인의 땅’ 에서 뜻을 잃고 오고가는 나그네들이 아닐까요? 정말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나의 피부를 쓰라리도록 하는 사진은 무엇인지? 이 번민이 계속되는 한 나의 사진은 방황을 멈추는 날까지 계속되는 숙명이겠지요.
이 사진들은 1985부터 1990년 까지 약 5년 정도 촬영된 것이다.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들) 사진집을 보고 내가 받은 감동 때문이었다. 1958년에 출판된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개인적, 보편적 진실의 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해야 할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고, 보고, 느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느끼는 객관적 시각이 아닌 나라는 개인의 주관적 시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 시대의 현상들, 정치, 경제, 문화,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현실들을 보도하거나 증언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느낌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러나 내 작업 또한 (미국인들)이 그러했듯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한 시대의 보편적 진실이 ‘나’라는 매체를 통과하며 사진 속에 담길 것이라 확신했다.
젊은 날 고향을 떠나 서울과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느끼게 된 전반적 생각은 나와 그리고 처지가 비슷한 사회적 약자와 빈곤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현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땅이 아니라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남들 같은 ‘타인의 땅’ 임을 느꼈다. 2013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땅에 있는가?
그 때에 써두었던 작가노트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타인의 땅, 우리들의 땅
할수록 어려운 것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조금 안다고 느끼게 되면서 더욱 막막하고, 더욱 괴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무엇이며, ‘시대의 현실’ 이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어떻게 아픔 없이 해명하며, 극복할 수 있을까? 철학은 긴 사설만 늘어놓고, 예술은 시끄럽게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나에겐 꿈속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문 밖의 소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타인의 땅’ 에서 뜻을 잃고 오고가는 나그네들이 아닐까요? 정말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나의 피부를 쓰라리도록 하는 사진은 무엇인지? 이 번민이 계속되는 한 나의 사진은 방황을 멈추는 날까지 계속되는 숙명이겠지요.
이갑철 Gap Chul Lee
1959년 진주에서 태어나, 1984년 신구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선조들의 삶의 정한과 신명, 끈질긴 생명력을 사진에 담아 왔다. [거리의 양키들](1984, 한마당화랑), [Images of the City](1986, 한마당화랑), [타인의 땅](1988, 경인미술관), [충돌과 반동](2002년 금호미술관), [에너지-氣](2007, 한미사진미술관), [부산 참견록](2015, 고은사진미술관)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00년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포토페스트 2000], 2002년 프랑스 몽펠리에 시에서 개최된 [한국 현대사진가 초대전] 등의 해외 전시에 초대되었다.
1959년 진주에서 태어나, 1984년 신구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선조들의 삶의 정한과 신명, 끈질긴 생명력을 사진에 담아 왔다. [거리의 양키들](1984, 한마당화랑), [Images of the City](1986, 한마당화랑), [타인의 땅](1988, 경인미술관), [충돌과 반동](2002년 금호미술관), [에너지-氣](2007, 한미사진미술관), [부산 참견록](2015, 고은사진미술관)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00년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포토페스트 2000], 2002년 프랑스 몽펠리에 시에서 개최된 [한국 현대사진가 초대전] 등의 해외 전시에 초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