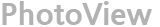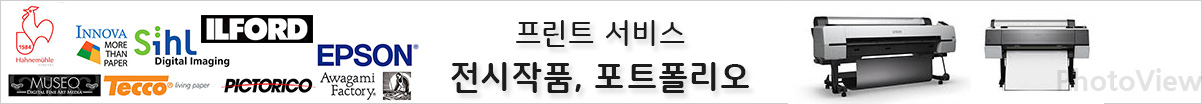프로이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 어린 시절 특별한 충격이나 사건들은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의식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무의식에 내재된 심층 기억의 단편으로 간주했다. 심리학적 모델을 찾고 있던 그는 자신의 이론인 의식과 무의식을 고고학적인 은유와 사진의 잠상으로 설명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에 완전히 파묻힌 고대도시 폼페이(Pompeii)는 카메라의 어둠상자에 기록된 잠상에 비유되는데, 이러한 잠재적인 지각 체제를 프로이드는 무의식으로 설명했다. 거기서 일단 녹음된 기억-이미지들(image-souvenirs)은 필름의 잠상과 같이 그대로 기록되고 축적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로마(Roma)는 어떤 특별한 자극에 의해 무의식에 내재된 기억-이미지들이 드러나는 의식에 비유된다.
프로이드는 또한 무의식은 언제나 의식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필름에 기록된 잠상과 그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development)으로 설명했다. 즉 무의식의 기억에 비유되는 암실의 필름은 잠상을 말하며, 어떠한 이유로 인해 무의식의 기억이 의식에 돌출되는 것은 로마의 폐허가 유적으로 발굴되듯이 잠상으로부터 화학적 반응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필름의 잠상-현상과 같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파편, 조각, 단편의 흔적으로만 나타나는 로마의 폐허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 행위의 원인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실수로 컵을 땅에 떨어뜨린 경우나 사소한 말다툼에 분노를 느끼는 경우라도 거기에는 연관된 무의식의 트라우마(trauma)가 있을 수 있다.
기억의 폼페이와 아리아드네의 실
프로이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 어린 시절 특별한 충격이나 사건들은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의식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무의식에 내재된 심층 기억의 단편으로 간주했다. 심리학적 모델을 찾고 있던 그는 자신의 이론인 의식과 무의식을 고고학적인 은유와 사진의 잠상으로 설명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에 완전히 파묻힌 고대도시 폼페이(Pompeii)는 카메라의 어둠상자에 기록된 잠상에 비유되는데, 이러한 잠재적인 지각 체제를 프로이드는 무의식으로 설명했다. 거기서 일단 녹음된 기억-이미지들(image-souvenirs)은 필름의 잠상과 같이 그대로 기록되고 축적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로마(Roma)는 어떤 특별한 자극에 의해 무의식에 내재된 기억-이미지들이 드러나는 의식에 비유된다.
프로이드는 또한 무의식은 언제나 의식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필름에 기록된 잠상과 그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development)으로 설명했다. 즉 무의식의 기억에 비유되는 암실의 필름은 잠상을 말하며, 어떠한 이유로 인해 무의식의 기억이 의식에 돌출되는 것은 로마의 폐허가 유적으로 발굴되듯이 잠상으로부터 화학적 반응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필름의 잠상-현상과 같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파편, 조각, 단편의 흔적으로만 나타나는 로마의 폐허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 행위의 원인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실수로 컵을 땅에 떨어뜨린 경우나 사소한 말다툼에 분노를 느끼는 경우라도 거기에는 연관된 무의식의 트라우마(trauma)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젯밤 꿈에서 보았던 산봉우리가 여인의 젖꼭지일 수도 있고, 싸우던 수탉을 떼어놓으면 한참 동안 주위를 돌아다니며 아무 것이나 쪼아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의식은 전이(轉移), 검열, 억압 등의 특별한 장치를 통해 선별되고 위장된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흔히 사진을 모델로 활용했는데, 이때 시각화 된 이미지들은 꿈, 환상, 레미니센스(réminiscence)와 같이 심리적으로 대부분 위장되고 왜곡된 은폐기억들(souvenirs-écrans)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 아득한 기억의 앨범을 넘겨보는 것 같은 작가 조은숙의 흑백 사진들은 촬영자의 무의식과 그것으로부터 연관된 사진적 행위(acte photographique)의 결과, 즉 무의식으로부터 위장된 기억의 단편들로 나타난다. 첫 눈에 사진들은 보여주는 장면 이외에 어떠한 내러티브도 허락하지 않는 침묵의 파노라마로 나타난다. 흑백의 어두운 배경에서 가끔씩 도식화된 공간과 비현실적인 현실, 그리고 모호한 형태로 출현한다. 예컨대 알 수 없는 거대한 모래집, 안개 속에 드러나는 나무, 잔잔한 물가에 드리워진 나뭇가지, 겹겹이 중복된 능선과 뭉게구름, 석양에 비친 굴뚝의 실루엣, 선인장 더미, 문창살과 덩굴, 버려진 원탁, 황량한 바닷가 등 의미 없는 풍경들과 자질구레한 소품들은 의심할 바 없이 작가 자신의 무의식에서 길어 낸, 그러나 무작위 랜덤으로 출현한 기억의 단편들이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빛바랜 흑백 이미지들은 바로 자신의 무의식에 부유하는 기억들을 위장해 놓은 것이다. 그것들은 이제 막 필름의 잠상에서 세상의 빛을 본 기억의 누설임과 동시에 처음으로 발굴된 폼페이의 흩어진 잔해들이다. 도대체 이러한 잔해의 수수께끼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또 거기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장면들의 이해는 읽기의 진행과정에서 시인이 무심코 던져 놓은 조탁의 언어들과 같이 의미의 부조리를 넘어 이미지가 발산하는 기억의 음색들이다. 그때 사진 메시지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있게 한 상황적인 원인으로 응시자 각자의 경험적 상황에 따라 유추될 뿐이다. 왜냐하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상황을 전달하는 사건 읽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단어들을 조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의 단편들은 이상하게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부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전혀 움직임이 없는 정적(靜寂)은 오히려 보는 이를 오싹하게 하면서 장면의 파노라마를 불러 온다. 거기서 장면은 곧 바로 응시자 자신의 기억으로 채워질 텅 빈 기억의 상자로 나타난다. 프루스트의 기억처럼 연상의 환유적 확장과 슬그머니 이어지는 장면의 릴레이, 그리고 이 모든 연상들은 응시자에게 아무 장면으로나 방사되는 마술적인 힘을 경험하게 한다. 그것은 아마도 응시자 각자의 상상에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푼크툼(punctum)일 것이다.
물가에 드리워진 나뭇가지, 버려진 의자, 흩어져 있는 잡초 더미, 숲 속 나무 실루엣 등은 어떤 희미한 기억의 단편 이외에 그 어떠한 해석학적인 논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비록 작가가 던져 놓은 실언들이지만 대부분 규명 불가능한 자신의 내적 존재들, 즉 재현을 위해 위장되어 나타난 장면이지만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아쉬움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미련들이다.
이럴 경우 사진이 외시하는 대상들은 궁극적으로 의미의 빗장을 벗기는 위장 그 자체이며 동시에 의미의 영역을 벗어나는 탈선, 그러나 겉은 없고 알맹이만 부유(浮流)하는 무의미(non sens)를 말한다. 전혀 의미의 옷을 입히지 않은 상황을 관객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돌려놓을 때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숱한 감정의 애환과 아쉬움이 영화의 장면들처럼 지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공통된 삶과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예술로서 사진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작가의 사진들은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는 사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발산하는 향기의 표면이다. 장면들은 작가의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억의 단편들, 말하자면 오로지 자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폼페이의 유적임과 동시에 응시자로 하여금 오늘날 엄청난 정보 홍수와 망각의 미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아리아드네(Ariadne)의 실인 셈이다.
이경률 (중앙대학교 교수, 사진이론가)
프로이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 어린 시절 특별한 충격이나 사건들은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의식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무의식에 내재된 심층 기억의 단편으로 간주했다. 심리학적 모델을 찾고 있던 그는 자신의 이론인 의식과 무의식을 고고학적인 은유와 사진의 잠상으로 설명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에 완전히 파묻힌 고대도시 폼페이(Pompeii)는 카메라의 어둠상자에 기록된 잠상에 비유되는데, 이러한 잠재적인 지각 체제를 프로이드는 무의식으로 설명했다. 거기서 일단 녹음된 기억-이미지들(image-souvenirs)은 필름의 잠상과 같이 그대로 기록되고 축적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로마(Roma)는 어떤 특별한 자극에 의해 무의식에 내재된 기억-이미지들이 드러나는 의식에 비유된다.
프로이드는 또한 무의식은 언제나 의식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필름에 기록된 잠상과 그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development)으로 설명했다. 즉 무의식의 기억에 비유되는 암실의 필름은 잠상을 말하며, 어떠한 이유로 인해 무의식의 기억이 의식에 돌출되는 것은 로마의 폐허가 유적으로 발굴되듯이 잠상으로부터 화학적 반응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필름의 잠상-현상과 같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파편, 조각, 단편의 흔적으로만 나타나는 로마의 폐허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 행위의 원인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실수로 컵을 땅에 떨어뜨린 경우나 사소한 말다툼에 분노를 느끼는 경우라도 거기에는 연관된 무의식의 트라우마(trauma)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젯밤 꿈에서 보았던 산봉우리가 여인의 젖꼭지일 수도 있고, 싸우던 수탉을 떼어놓으면 한참 동안 주위를 돌아다니며 아무 것이나 쪼아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의식은 전이(轉移), 검열, 억압 등의 특별한 장치를 통해 선별되고 위장된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흔히 사진을 모델로 활용했는데, 이때 시각화 된 이미지들은 꿈, 환상, 레미니센스(réminiscence)와 같이 심리적으로 대부분 위장되고 왜곡된 은폐기억들(souvenirs-écrans)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 아득한 기억의 앨범을 넘겨보는 것 같은 작가 조은숙의 흑백 사진들은 촬영자의 무의식과 그것으로부터 연관된 사진적 행위(acte photographique)의 결과, 즉 무의식으로부터 위장된 기억의 단편들로 나타난다. 첫 눈에 사진들은 보여주는 장면 이외에 어떠한 내러티브도 허락하지 않는 침묵의 파노라마로 나타난다. 흑백의 어두운 배경에서 가끔씩 도식화된 공간과 비현실적인 현실, 그리고 모호한 형태로 출현한다. 예컨대 알 수 없는 거대한 모래집, 안개 속에 드러나는 나무, 잔잔한 물가에 드리워진 나뭇가지, 겹겹이 중복된 능선과 뭉게구름, 석양에 비친 굴뚝의 실루엣, 선인장 더미, 문창살과 덩굴, 버려진 원탁, 황량한 바닷가 등 의미 없는 풍경들과 자질구레한 소품들은 의심할 바 없이 작가 자신의 무의식에서 길어 낸, 그러나 무작위 랜덤으로 출현한 기억의 단편들이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빛바랜 흑백 이미지들은 바로 자신의 무의식에 부유하는 기억들을 위장해 놓은 것이다. 그것들은 이제 막 필름의 잠상에서 세상의 빛을 본 기억의 누설임과 동시에 처음으로 발굴된 폼페이의 흩어진 잔해들이다. 도대체 이러한 잔해의 수수께끼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또 거기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장면들의 이해는 읽기의 진행과정에서 시인이 무심코 던져 놓은 조탁의 언어들과 같이 의미의 부조리를 넘어 이미지가 발산하는 기억의 음색들이다. 그때 사진 메시지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있게 한 상황적인 원인으로 응시자 각자의 경험적 상황에 따라 유추될 뿐이다. 왜냐하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상황을 전달하는 사건 읽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단어들을 조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의 단편들은 이상하게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부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전혀 움직임이 없는 정적(靜寂)은 오히려 보는 이를 오싹하게 하면서 장면의 파노라마를 불러 온다. 거기서 장면은 곧 바로 응시자 자신의 기억으로 채워질 텅 빈 기억의 상자로 나타난다. 프루스트의 기억처럼 연상의 환유적 확장과 슬그머니 이어지는 장면의 릴레이, 그리고 이 모든 연상들은 응시자에게 아무 장면으로나 방사되는 마술적인 힘을 경험하게 한다. 그것은 아마도 응시자 각자의 상상에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푼크툼(punctum)일 것이다.
물가에 드리워진 나뭇가지, 버려진 의자, 흩어져 있는 잡초 더미, 숲 속 나무 실루엣 등은 어떤 희미한 기억의 단편 이외에 그 어떠한 해석학적인 논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비록 작가가 던져 놓은 실언들이지만 대부분 규명 불가능한 자신의 내적 존재들, 즉 재현을 위해 위장되어 나타난 장면이지만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아쉬움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미련들이다.
이럴 경우 사진이 외시하는 대상들은 궁극적으로 의미의 빗장을 벗기는 위장 그 자체이며 동시에 의미의 영역을 벗어나는 탈선, 그러나 겉은 없고 알맹이만 부유(浮流)하는 무의미(non sens)를 말한다. 전혀 의미의 옷을 입히지 않은 상황을 관객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돌려놓을 때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숱한 감정의 애환과 아쉬움이 영화의 장면들처럼 지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공통된 삶과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예술로서 사진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작가의 사진들은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는 사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발산하는 향기의 표면이다. 장면들은 작가의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억의 단편들, 말하자면 오로지 자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폼페이의 유적임과 동시에 응시자로 하여금 오늘날 엄청난 정보 홍수와 망각의 미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아리아드네(Ariadne)의 실인 셈이다.
이경률 (중앙대학교 교수, 사진이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