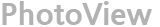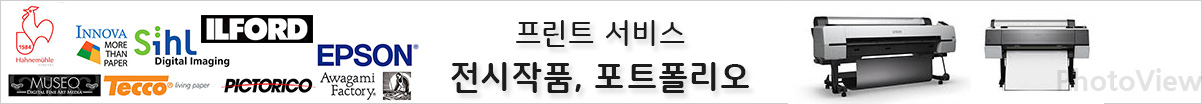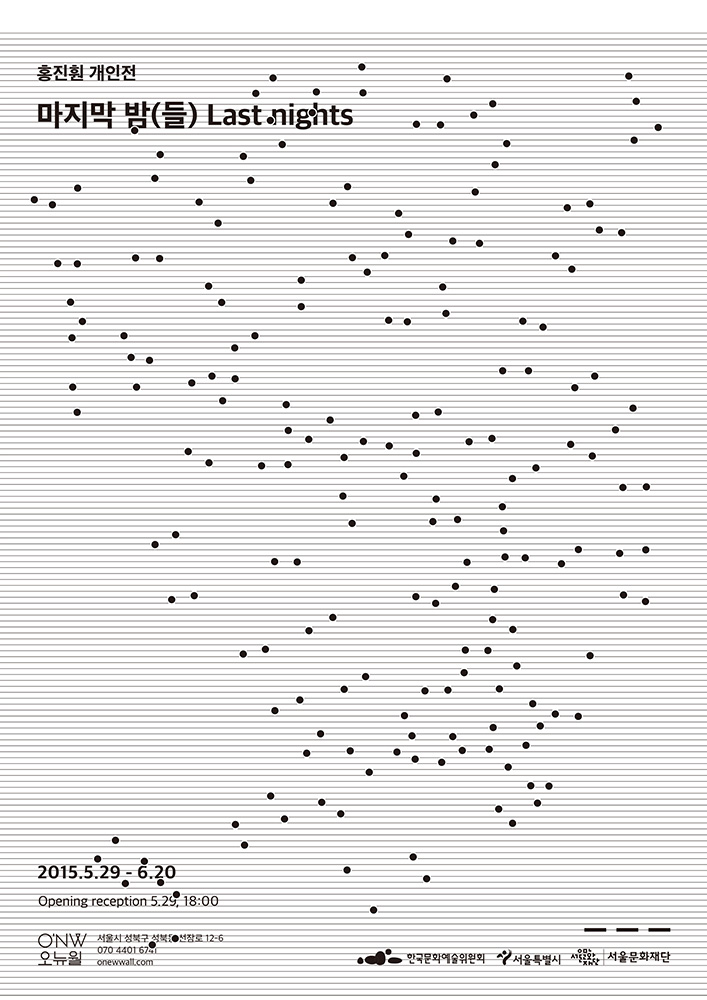I thought I was quite used to the world where everyone is required to speed up and endure that speed. I thought there was nothing special about the society where people became less emotional as they found it tough to make their ends meet. It was rather an easy task to watch others' competing to survive, feeling sorry for them and thinking I have nothing to do with such struggle. It only took some efforts to console myself, ignoring the fact that I was falling behind others. April 2014 was such a moment.
In the end, it turned out that everyone's endeavor to speed up betrayed every person who was engaging in such struggle. A philosopher once said "suspension stands for death". However, all of sudden, I came to realize it was also the case when things are the other way around. Spending lethargic days, it suddenly came to me - we need a place to come up for air. A place where people can slow down the pace for a while. It does not matter wherever it is, whatever it seems like. We just need a small space that we can take breath. I wanted to see our pause, the moment where everyone is taking a breath - if possible.
마지막 밤(들) - 홍진훤展
스페이스 오뉴월
스페이스 오뉴월에서는 홍진훤 개인전 [마지막 밤(들)_last nights]을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다. 자신을 풍경 사진작가로 규정하는 홍진훤은 첫 번째 개인전 [임시풍경]에서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도시 개발, 경제 성장을 가장한 맹목적 토목 및 건설 사업이 초래한 생태 환경의 황폐화, 사회적 삶의 인간적 조건이 뿌리째 뽑혀 나간 채 자행된 도심 재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두 번째 개인전 [붉은, 초록]은 제주-오키나와-밀양-후쿠시마로 이어지는 풍경을 기록한 네 곳의 풍경으로부터 이 풍경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초록의 존재들에서 파헤쳤다. 그가 발견한 것은 역사 그 자체가 퇴적된 생존한 것들이었고 인간이 생산한 비인간성의 흔적들과 기억들이 붉은 피를 먹고 자라나 초록의 역사로 자리를 지키는 현장이었다.
속도 중독의 시대, 전국 210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민낯 풍경
이번 세 번째 개인전 [마지막 밤(들)]은 한국 근대화의 혈맥인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담는다. 평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허용된, 작가의 표현대로라면 ‘무책임한 무질서’가 좋아서 시작된 작업은 전국의 휴게소를 담아가는 상황에서 점점 늘어가는 고민거리와 맞닥뜨려야 했다.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가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법적으로 25킬로미터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는 휴게소는 낮의 얼굴과 밤의 얼굴이 달랐다. 그가 사회적 속도의 상징이라 여긴 고속도로의 틈이자 궤도 이탈의 공식적 합일점이 휴게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휴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누구도 제 삶의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게소는 머물며 쉴 곳이 아니라 어느새 낯선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작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37개의 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며 추풍령휴게소를 시작으로 210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홍진훤은 지도에 표시된 고속도로 휴게소를 모두 돌아다니며 그 풍경들을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취한 사진의 방식은 해가 지고 난 후 휴게소의 단편들이다. 휴게소의 조명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휴게소의 민낯이 드러난다. 전국을 돌고 지금의 전시를 준비했다. 사진은 남았고 그 사진이 이제 우리가 볼 전시에서 선보인다. 그러나 그가 이 허망한 여행을 마치고 정한 제목은 [마지막 밤(들)]이다. 그가 1년을 지켜본 휴게소 풍경은 지난 1년 사이 자신에게 또 다른 과업을 부여한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지류에서 출발한 그의 작업은 삶에서 벌어지고 마는, 벌어지지 말았어야 할 우리 삶의 사태와 좀처럼 거리를 두지 못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속도가 초래한 예외적 사태들에 눈 돌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지는 죽음”이라는 철학자 폴 비릴리오의 선언이 그 반대의 결과에서도 무력함을 알아버리고 난 후, 그가 순회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숨이 차고 멀미 나는 공간이었다. 그는 어지러운 상징들과 이해할 수 없는 빛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쉼은 유예되고 속도에 떠밀려 난파된 고립된 섬을 보았다. 부유물과 자신과 상관없는 빛에 노출된 섬이 그곳에 떠도는 것이다. 그곳에서 자신마저도 섬이 되고 마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난신호를 타전하는 '마지막 밤'들의 기록
홍진훤은 전국을 돌고 제 자리에 돌아왔더니 이제 자신이 돌아올 곳이 없었다고 술회한다. 그 과정에서 만난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의 책의 구절은 이번 전시를 위한 생각의 단초가 되었다. “경무대 앞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무얼 몰라서 총 맞아 죽은 것이 아니며, 거대한 폭력에 에워싸인 광주의 젊은이들이 그 마지막 밤에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 도청을 사수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마지막 밤(들)]이라는 이번 전시는 자신이 보고 만 조난신호에 대한 증명이다. 하나의, 최후의 밤이 아닌, 끈질기게 되돌아오는 그 밤들에 대해 담고 반추할 밖에 없었던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 그 풍경을 의심하고 그 풍경들을 좇아 다닌 자신을 의심하는 지금 상황이 바로 이 전시다.
그가 아무리 “아무튼 나는 에둘러 가려다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며 이 사진들이 그 허망한 표류의 기록들이 될 것이라 할지언정 조난신호는 결국 모두 발견된 신호다. 비록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늦음이 타전을 보낸 이들에게는 공허할 터이지만 우리의 시차와 사진이 보내는 시차는 작가의 허무와 반성으로만 갈무리될 대상이 절대 아니다. 근대화의 조난신호가 전하는 [마지막 밤(들)]은 고속도로의 풍경이 시사하는 우리 삶의 풍경에 대해서 담는다. 하나의 지류만을 간취해도 좋고 이 전시를 통해 오늘의 속도가 어떻게 삶에서 유예되고 낯섦을 자아내는지 대면해도 좋다. [마지막 밤(들)]이 전시 제목에서 복수의 형태를 취하듯이, 우리에게는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밤의 역사가 있고 그 밤의 기록자이자 증명자가 여기 존재한다.
스페이스 오뉴월
스페이스 오뉴월에서는 홍진훤 개인전 [마지막 밤(들)_last nights]을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다. 자신을 풍경 사진작가로 규정하는 홍진훤은 첫 번째 개인전 [임시풍경]에서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도시 개발, 경제 성장을 가장한 맹목적 토목 및 건설 사업이 초래한 생태 환경의 황폐화, 사회적 삶의 인간적 조건이 뿌리째 뽑혀 나간 채 자행된 도심 재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두 번째 개인전 [붉은, 초록]은 제주-오키나와-밀양-후쿠시마로 이어지는 풍경을 기록한 네 곳의 풍경으로부터 이 풍경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초록의 존재들에서 파헤쳤다. 그가 발견한 것은 역사 그 자체가 퇴적된 생존한 것들이었고 인간이 생산한 비인간성의 흔적들과 기억들이 붉은 피를 먹고 자라나 초록의 역사로 자리를 지키는 현장이었다.
속도 중독의 시대, 전국 210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민낯 풍경
이번 세 번째 개인전 [마지막 밤(들)]은 한국 근대화의 혈맥인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담는다. 평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허용된, 작가의 표현대로라면 ‘무책임한 무질서’가 좋아서 시작된 작업은 전국의 휴게소를 담아가는 상황에서 점점 늘어가는 고민거리와 맞닥뜨려야 했다.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가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법적으로 25킬로미터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는 휴게소는 낮의 얼굴과 밤의 얼굴이 달랐다. 그가 사회적 속도의 상징이라 여긴 고속도로의 틈이자 궤도 이탈의 공식적 합일점이 휴게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휴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누구도 제 삶의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게소는 머물며 쉴 곳이 아니라 어느새 낯선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작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37개의 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며 추풍령휴게소를 시작으로 210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홍진훤은 지도에 표시된 고속도로 휴게소를 모두 돌아다니며 그 풍경들을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취한 사진의 방식은 해가 지고 난 후 휴게소의 단편들이다. 휴게소의 조명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휴게소의 민낯이 드러난다. 전국을 돌고 지금의 전시를 준비했다. 사진은 남았고 그 사진이 이제 우리가 볼 전시에서 선보인다. 그러나 그가 이 허망한 여행을 마치고 정한 제목은 [마지막 밤(들)]이다. 그가 1년을 지켜본 휴게소 풍경은 지난 1년 사이 자신에게 또 다른 과업을 부여한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지류에서 출발한 그의 작업은 삶에서 벌어지고 마는, 벌어지지 말았어야 할 우리 삶의 사태와 좀처럼 거리를 두지 못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속도가 초래한 예외적 사태들에 눈 돌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지는 죽음”이라는 철학자 폴 비릴리오의 선언이 그 반대의 결과에서도 무력함을 알아버리고 난 후, 그가 순회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숨이 차고 멀미 나는 공간이었다. 그는 어지러운 상징들과 이해할 수 없는 빛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쉼은 유예되고 속도에 떠밀려 난파된 고립된 섬을 보았다. 부유물과 자신과 상관없는 빛에 노출된 섬이 그곳에 떠도는 것이다. 그곳에서 자신마저도 섬이 되고 마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난신호를 타전하는 '마지막 밤'들의 기록
홍진훤은 전국을 돌고 제 자리에 돌아왔더니 이제 자신이 돌아올 곳이 없었다고 술회한다. 그 과정에서 만난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의 책의 구절은 이번 전시를 위한 생각의 단초가 되었다. “경무대 앞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무얼 몰라서 총 맞아 죽은 것이 아니며, 거대한 폭력에 에워싸인 광주의 젊은이들이 그 마지막 밤에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 도청을 사수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마지막 밤(들)]이라는 이번 전시는 자신이 보고 만 조난신호에 대한 증명이다. 하나의, 최후의 밤이 아닌, 끈질기게 되돌아오는 그 밤들에 대해 담고 반추할 밖에 없었던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 그 풍경을 의심하고 그 풍경들을 좇아 다닌 자신을 의심하는 지금 상황이 바로 이 전시다.
그가 아무리 “아무튼 나는 에둘러 가려다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며 이 사진들이 그 허망한 표류의 기록들이 될 것이라 할지언정 조난신호는 결국 모두 발견된 신호다. 비록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늦음이 타전을 보낸 이들에게는 공허할 터이지만 우리의 시차와 사진이 보내는 시차는 작가의 허무와 반성으로만 갈무리될 대상이 절대 아니다. 근대화의 조난신호가 전하는 [마지막 밤(들)]은 고속도로의 풍경이 시사하는 우리 삶의 풍경에 대해서 담는다. 하나의 지류만을 간취해도 좋고 이 전시를 통해 오늘의 속도가 어떻게 삶에서 유예되고 낯섦을 자아내는지 대면해도 좋다. [마지막 밤(들)]이 전시 제목에서 복수의 형태를 취하듯이, 우리에게는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밤의 역사가 있고 그 밤의 기록자이자 증명자가 여기 존재한다.
마지막 밤(들)
속도를 요구하는 세상 따위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사는 게 점점 팍팍해지고 모두가 점점 메말라갔지만 큰일 아니라 생각했다. 그 궤도에서 조금 비껴나 생존의 질주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이었다. 그저 점점 뒤처져가는 나를 자위하는 시간이 조금씩 느는 수고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2014년의 4월을 맞았다.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말았다. 속도를 향한 모두의 열심은 모두의 눈앞에서 모두를 배신했다. “정지는 죽음”이라는 한 철학자의 선언, 그 반대의 결과도 마찬가지임을 너무나 갑자기 알아버렸다. 무력의 날들을 보내며 우리에게도 잠시 숨 돌릴 곳 하나쯤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속도를 잠시라도 줄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어떠한 모양이든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빈틈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멈춤을, 속도의 단절을 확인하고 싶었다.
평소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면 가능한 많은 휴게소를 들렀다. 그 무책임한 무질서가 좋았다. 누구도 정주하지 않는 공간이자 누구에게도 목적지가 되지 않는 그곳은 고속도로에서 허락된 조악하지만 유일한 해방구였다. 속도에 구겨진 몸을 잠시 쉬게 하는 곳, 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사회적 속도의 상징인 고속도로 사이 조그만 틈들이 휴게소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 덕에 우리는 멈출 수 없을 듯 뻗은 이 길 언저리에서 잠시나마 궤도의 이탈을 허락 받는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37개의 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며 추풍령휴게소를 시작으로 210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지도에 표시된 고속도로 휴게소를 모두 돌아다니며 그 풍경을 응시했다. 해가 지고 휴게소의 조명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속도유예공간’의 민낯이 드러난다.
하지만 순진한 나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아채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질주에서 벗어나 잠시 숨 돌릴 공간을 찾겠다고 왔지만 정작 적막한 휴게소의 풍경을 바라보자면 이내 숨이 차고 멀미가 난다. 어지러운 상징과 이해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 찬 그곳은 쉼을 선택한 이들의 일시적 해방구라기보다는 차라리 속도에 떠밀린 존재들이 모여 사는 외딴 섬마을처럼 보였다. 제자리가 아닌 곳에 부유물처럼 떠다니다가 밤이 되면 축축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신과 상관없는 빛 아래 서서 먼 바다를 멍하니 바라본다. 결국 그걸 지켜보는 나 역시 그러하다.
누군가 묻는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 적막한 소음이 가득한 곳, 눈부신 어둠이 있는 곳, 쉼의 노동이 존재하는 곳, 근대적 현대가 창조되는 곳, 전쟁의 평화를 기념하는 곳, 온갖 소비를 구매하는 곳……. 모르겠다. 결국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연신 카메라 셔터나 끊어댄다. 그저 초록 쇠창살에 갇혀 나를 경계하는 토끼 한 마리가 가여울 뿐이다.
거대한 탱크 앞 포토 존에서 쓴 웃음을 지어본다. 팔 잘린 비너스 앞으로 자동차를 가득 실은 자동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니 태극기로 뒤덮인 캄캄한 공원에 코카콜라 자판기만 유난히 빛나고 있다. 편의점 직원은 피곤했는지 이미 엎드려 잠이 들었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는 소리 꺼진 TV 뉴스만 흘러나오고 있다. 동이 터오면 그나마 남아 있던 누런 조명마저 하나둘 꺼지고 휴게소는 점점 더 어두워진다. 그럼 나도 차를 몰고 다시 궤도에 오른다. 하루의 시작이자 하루의 끝이다.
속도의 단절을 확인하겠다고 내달린 길이 5천 킬로미터는 족히 넘어 보인다. 빨리 멈추기 위해 더 빨리 달렸고 한 곳이라도 더 멈추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가 출발한 그곳이 아니다. 허망한 여행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르려 집어든 황현산 선생의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다. “경무대 앞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무얼 몰라서 총 맞아 죽은 것이 아니며, 거대한 폭력에 에워싸인 광주의 젊은이들이 그 마지막 밤에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 도청을 사수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마지막 밤”이라는 단어에 왜 휴게소의 밤풍경들이 다시금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질주를 막아보려 먼 곳만 바라보던 그 밤(들)이 떠올라서였을까. 어쩌면 그 밤(들)은 그 자체로 신호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것투성이다. 찍었던 사진들을 뒤적거리다 몇 해 전 한 사진가의 도록에서 본 “그래서 에둘러 간 것일까. 암튼 나는 에둘러 갔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나의 경우에는 “암튼 나는 에둘러 가려다가 수렁에 빠졌다”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진들이 그 덧없는 표류의 애잔한 기록이 될 듯하다.
속도를 요구하는 세상 따위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사는 게 점점 팍팍해지고 모두가 점점 메말라갔지만 큰일 아니라 생각했다. 그 궤도에서 조금 비껴나 생존의 질주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이었다. 그저 점점 뒤처져가는 나를 자위하는 시간이 조금씩 느는 수고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2014년의 4월을 맞았다.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말았다. 속도를 향한 모두의 열심은 모두의 눈앞에서 모두를 배신했다. “정지는 죽음”이라는 한 철학자의 선언, 그 반대의 결과도 마찬가지임을 너무나 갑자기 알아버렸다. 무력의 날들을 보내며 우리에게도 잠시 숨 돌릴 곳 하나쯤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속도를 잠시라도 줄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어떠한 모양이든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빈틈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멈춤을, 속도의 단절을 확인하고 싶었다.
평소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면 가능한 많은 휴게소를 들렀다. 그 무책임한 무질서가 좋았다. 누구도 정주하지 않는 공간이자 누구에게도 목적지가 되지 않는 그곳은 고속도로에서 허락된 조악하지만 유일한 해방구였다. 속도에 구겨진 몸을 잠시 쉬게 하는 곳, 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사회적 속도의 상징인 고속도로 사이 조그만 틈들이 휴게소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 덕에 우리는 멈출 수 없을 듯 뻗은 이 길 언저리에서 잠시나마 궤도의 이탈을 허락 받는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37개의 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며 추풍령휴게소를 시작으로 210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지도에 표시된 고속도로 휴게소를 모두 돌아다니며 그 풍경을 응시했다. 해가 지고 휴게소의 조명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속도유예공간’의 민낯이 드러난다.
하지만 순진한 나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아채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질주에서 벗어나 잠시 숨 돌릴 공간을 찾겠다고 왔지만 정작 적막한 휴게소의 풍경을 바라보자면 이내 숨이 차고 멀미가 난다. 어지러운 상징과 이해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 찬 그곳은 쉼을 선택한 이들의 일시적 해방구라기보다는 차라리 속도에 떠밀린 존재들이 모여 사는 외딴 섬마을처럼 보였다. 제자리가 아닌 곳에 부유물처럼 떠다니다가 밤이 되면 축축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신과 상관없는 빛 아래 서서 먼 바다를 멍하니 바라본다. 결국 그걸 지켜보는 나 역시 그러하다.
누군가 묻는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 적막한 소음이 가득한 곳, 눈부신 어둠이 있는 곳, 쉼의 노동이 존재하는 곳, 근대적 현대가 창조되는 곳, 전쟁의 평화를 기념하는 곳, 온갖 소비를 구매하는 곳……. 모르겠다. 결국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연신 카메라 셔터나 끊어댄다. 그저 초록 쇠창살에 갇혀 나를 경계하는 토끼 한 마리가 가여울 뿐이다.
거대한 탱크 앞 포토 존에서 쓴 웃음을 지어본다. 팔 잘린 비너스 앞으로 자동차를 가득 실은 자동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니 태극기로 뒤덮인 캄캄한 공원에 코카콜라 자판기만 유난히 빛나고 있다. 편의점 직원은 피곤했는지 이미 엎드려 잠이 들었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는 소리 꺼진 TV 뉴스만 흘러나오고 있다. 동이 터오면 그나마 남아 있던 누런 조명마저 하나둘 꺼지고 휴게소는 점점 더 어두워진다. 그럼 나도 차를 몰고 다시 궤도에 오른다. 하루의 시작이자 하루의 끝이다.
속도의 단절을 확인하겠다고 내달린 길이 5천 킬로미터는 족히 넘어 보인다. 빨리 멈추기 위해 더 빨리 달렸고 한 곳이라도 더 멈추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가 출발한 그곳이 아니다. 허망한 여행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르려 집어든 황현산 선생의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다. “경무대 앞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무얼 몰라서 총 맞아 죽은 것이 아니며, 거대한 폭력에 에워싸인 광주의 젊은이들이 그 마지막 밤에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 도청을 사수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마지막 밤”이라는 단어에 왜 휴게소의 밤풍경들이 다시금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질주를 막아보려 먼 곳만 바라보던 그 밤(들)이 떠올라서였을까. 어쩌면 그 밤(들)은 그 자체로 신호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것투성이다. 찍었던 사진들을 뒤적거리다 몇 해 전 한 사진가의 도록에서 본 “그래서 에둘러 간 것일까. 암튼 나는 에둘러 갔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나의 경우에는 “암튼 나는 에둘러 가려다가 수렁에 빠졌다”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진들이 그 덧없는 표류의 애잔한 기록이 될 듯하다.
Last nights
I thought I was quite used to the world where everyone is required to speed up and endure that speed. I thought there was nothing special about the society where people became less emotional as they found it tough to make their ends meet. It was rather an easy task to watch others' competing to survive, feeling sorry for them and thinking I have nothing to do with such struggle. It only took some efforts to console myself, ignoring the fact that I was falling behind others. April 2014 was such a moment.
In the end, it turned out that everyone's endeavor to speed up betrayed every person who was engaging in such struggle. A philosopher once said "suspension stands for death". However, all of sudden, I came to realize it was also the case when things are the other way around. Spending lethargic days, it suddenly came to me - we need a place to come up for air. A place where people can slow down the pace for a while. It does not matter wherever it is, whatever it seems like. We just need a small space that we can take breath. I wanted to see our pause, the moment where everyone is taking a breath - if possible.
I used to drop by as many service stations as possible when I needed to take the expressway. I liked that irresponsible disorder. Nobody settles in that place and no one would consider that space a final destination. Service stations were the only available havens on expressway, though they were somewhat shoddy. It was a space where people can rest their shattered bodies and take a deep breath before getting themselves back on track. Service stations are some cracks in the expressway - which symbolizes this society's obsession with speed. Thanks to their presence, we are allowed to stand beside the orbit on the brink of the highway that seems infinitely extended.
Since the opening of the Gyeongbu Expressway, which is the epitome of Korea's modernization in the 1970s, there are 37 expressways and 210 service stations in South Korea that are in business, started from the opening of service station at Chupungnyeong. I visited all the service stations on the map and stared at the scenery of those. As darkness fell and street lights started to be turned off one by one, people leave the station. That is when we can see the naked reality of a space in which we are allowed to slow down the pace.
However, it does not take so long realize that my naive expectations proved futile. Though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take a breath outside of the orbit of fierce speeding, it is sickening and nauseating to keep staring at the desolate scenery of service stations. That space was full of dizzying symbols and inapprehensible lights. It was not a haven for people who chose to take a rest for a while. Rather, it seemed as if a remote island village where those who fall behind others in a race turned to. They float around in the sea where they do not belong to and gaze into the sea with vacant eyes when the day turns into the night - in a moist ocean breeze, under the ligh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m. It was the true for me as I look at them with silence.
If someone asks me the meaning of the space that I am standing on, how can I illustrate this place?
Is it a room filled with quiet noises?
A place where you can see darkness full of shine?
A place of labor with relaxation?
Is it an era of modern-contemporary?
A place where people commemorate peace of war?
Or, is it a space people purchase all types of consumption?
I found myself perplexed. I just could not stop clicking the shutter as I fail to find the right answer. All I could feel was pity for a rabbit that looks at me so warily behind green iron bars.
I wore bittersweet smile at the photo zone in front of the massive tank. A car loaded with cars is passing by the Venus that lost its arm. I looked around the place with a 500 won coffee from a vending machine. The only shiny thing I could see in the park covered with the Korean flag was the light from a Coca-Cola vending machine. A tired clerk in the convenient store already fell asleep and only TV news came from an empty restaurant. The service station gets darker when it dawns, as remaining yellow lights start to be turned off one by one. Then I put myself back on the road. This is how my day starts and ends.
The road I took to see the pause of speed seemed to exceed over 5,000kms. I speeded up more and more to stop as soon as possible and I kept on driving to drop by as many places as possible. I finally came back to my place but it was not the place I started my journey. After putting an end to my futile trip, I picked up a book of Hwang Hyun-san to get myself together and encountered this phrase. “Many students at Gyeongmudae did not end up being shot to death because of their ignorance. Also, numerous students did not die of tragic violence in Gwangju as they put themselves into saving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simply because they took everything so easy in the last night.”
I do not know why I recollected the scenes of nights at service stations when I saw the phrase “last nights.” Is it because I recall the nights that I stared far ahead to stop an endless speed race? Probably those nights were some signals in and of themselves. However, there are too many things that I cannot understand. I looked through the pictures that I took and a phrase I saw in a portfolio of a photographer few years ago suddenly dawn on me. “Is that the reason I chose to beat around the bush? Anyway, I chose to make a detour.” I thought about this phrase and concluded that “I chose to take a roundabout way and I ended up getting stuck in mire.” And these photos would be a sad record of my futile drift. (Jinhwon Hong)
I thought I was quite used to the world where everyone is required to speed up and endure that speed. I thought there was nothing special about the society where people became less emotional as they found it tough to make their ends meet. It was rather an easy task to watch others' competing to survive, feeling sorry for them and thinking I have nothing to do with such struggle. It only took some efforts to console myself, ignoring the fact that I was falling behind others. April 2014 was such a moment.
In the end, it turned out that everyone's endeavor to speed up betrayed every person who was engaging in such struggle. A philosopher once said "suspension stands for death". However, all of sudden, I came to realize it was also the case when things are the other way around. Spending lethargic days, it suddenly came to me - we need a place to come up for air. A place where people can slow down the pace for a while. It does not matter wherever it is, whatever it seems like. We just need a small space that we can take breath. I wanted to see our pause, the moment where everyone is taking a breath - if possible.
I used to drop by as many service stations as possible when I needed to take the expressway. I liked that irresponsible disorder. Nobody settles in that place and no one would consider that space a final destination. Service stations were the only available havens on expressway, though they were somewhat shoddy. It was a space where people can rest their shattered bodies and take a deep breath before getting themselves back on track. Service stations are some cracks in the expressway - which symbolizes this society's obsession with speed. Thanks to their presence, we are allowed to stand beside the orbit on the brink of the highway that seems infinitely extended.
Since the opening of the Gyeongbu Expressway, which is the epitome of Korea's modernization in the 1970s, there are 37 expressways and 210 service stations in South Korea that are in business, started from the opening of service station at Chupungnyeong. I visited all the service stations on the map and stared at the scenery of those. As darkness fell and street lights started to be turned off one by one, people leave the station. That is when we can see the naked reality of a space in which we are allowed to slow down the pace.
However, it does not take so long realize that my naive expectations proved futile. Though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take a breath outside of the orbit of fierce speeding, it is sickening and nauseating to keep staring at the desolate scenery of service stations. That space was full of dizzying symbols and inapprehensible lights. It was not a haven for people who chose to take a rest for a while. Rather, it seemed as if a remote island village where those who fall behind others in a race turned to. They float around in the sea where they do not belong to and gaze into the sea with vacant eyes when the day turns into the night - in a moist ocean breeze, under the ligh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m. It was the true for me as I look at them with silence.
If someone asks me the meaning of the space that I am standing on, how can I illustrate this place?
Is it a room filled with quiet noises?
A place where you can see darkness full of shine?
A place of labor with relaxation?
Is it an era of modern-contemporary?
A place where people commemorate peace of war?
Or, is it a space people purchase all types of consumption?
I found myself perplexed. I just could not stop clicking the shutter as I fail to find the right answer. All I could feel was pity for a rabbit that looks at me so warily behind green iron bars.
I wore bittersweet smile at the photo zone in front of the massive tank. A car loaded with cars is passing by the Venus that lost its arm. I looked around the place with a 500 won coffee from a vending machine. The only shiny thing I could see in the park covered with the Korean flag was the light from a Coca-Cola vending machine. A tired clerk in the convenient store already fell asleep and only TV news came from an empty restaurant. The service station gets darker when it dawns, as remaining yellow lights start to be turned off one by one. Then I put myself back on the road. This is how my day starts and ends.
The road I took to see the pause of speed seemed to exceed over 5,000kms. I speeded up more and more to stop as soon as possible and I kept on driving to drop by as many places as possible. I finally came back to my place but it was not the place I started my journey. After putting an end to my futile trip, I picked up a book of Hwang Hyun-san to get myself together and encountered this phrase. “Many students at Gyeongmudae did not end up being shot to death because of their ignorance. Also, numerous students did not die of tragic violence in Gwangju as they put themselves into saving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simply because they took everything so easy in the last night.”
I do not know why I recollected the scenes of nights at service stations when I saw the phrase “last nights.” Is it because I recall the nights that I stared far ahead to stop an endless speed race? Probably those nights were some signals in and of themselves. However, there are too many things that I cannot understand. I looked through the pictures that I took and a phrase I saw in a portfolio of a photographer few years ago suddenly dawn on me. “Is that the reason I chose to beat around the bush? Anyway, I chose to make a detour.” I thought about this phrase and concluded that “I chose to take a roundabout way and I ended up getting stuck in mire.” And these photos would be a sad record of my futile drift. (Jinhwon Hong)
홍진훤 Jinhwon Hong
개인전
2015 [마지막 밤(들)]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4 [붉은, 초록] 스페이스99, 서울
2013 [임시풍경] 스페이스99, 서울
주요단체전
2015 [Peace, Voice, Nice]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5 [Minima Moralia] 이르쿠츠크 국립 미술관 수카초바, 이르쿠츠크, 러시아
2015 [장면의 탄생] 갤러리 룩스, 서울
2014 [우리는 왜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가?] 더 텍사스프로젝트, 서울
2014 [언데드] 대안공간 이포, 서울
2014 [서울루나포토페스티벌]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2014 [4시간 16분동안의 전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서울
2014 [밀양을 살다] 갤러리 류가헌, 서울
2014 [밀양_그 은밀한 빛] 주차장 인 사람, 서울
2013 [빛에 빚지다] 갤러리 류가헌, 서울
2013 [이어지다_Tie] 이앙 갤러리, 서울
2012 [Drifting Images] Makii Masaru Fine Arts, 도쿄, 일본
2012 [Take Left] 갤러리 나우, 서울
2010 [Asian Contemporary Photography] A.M Galley, 브라이튼, 영국
2010 [Portraitless portrait] 포토텔링, 서울
2010 [제11회 사진비평상 수상자전] 이룸 갤러리, 서울
기타활동
2014 [2014 바이칼 노마딕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평화박물관 2013 올해의 작가] 선정, 평화박물관
2009 [제11회 사진비평상] 수상, 포토스페이스
개인전
2015 [마지막 밤(들)]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4 [붉은, 초록] 스페이스99, 서울
2013 [임시풍경] 스페이스99, 서울
주요단체전
2015 [Peace, Voice, Nice]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5 [Minima Moralia] 이르쿠츠크 국립 미술관 수카초바, 이르쿠츠크, 러시아
2015 [장면의 탄생] 갤러리 룩스, 서울
2014 [우리는 왜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가?] 더 텍사스프로젝트, 서울
2014 [언데드] 대안공간 이포, 서울
2014 [서울루나포토페스티벌]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2014 [4시간 16분동안의 전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서울
2014 [밀양을 살다] 갤러리 류가헌, 서울
2014 [밀양_그 은밀한 빛] 주차장 인 사람, 서울
2013 [빛에 빚지다] 갤러리 류가헌, 서울
2013 [이어지다_Tie] 이앙 갤러리, 서울
2012 [Drifting Images] Makii Masaru Fine Arts, 도쿄, 일본
2012 [Take Left] 갤러리 나우, 서울
2010 [Asian Contemporary Photography] A.M Galley, 브라이튼, 영국
2010 [Portraitless portrait] 포토텔링, 서울
2010 [제11회 사진비평상 수상자전] 이룸 갤러리, 서울
기타활동
2014 [2014 바이칼 노마딕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평화박물관 2013 올해의 작가] 선정, 평화박물관
2009 [제11회 사진비평상] 수상, 포토스페이스
Jinhwon Hong
Individual Exhibitions
2015 [Last nights] Space O’NewWall, Seoul
2014 [Crimson, Green] space99, Seoul
2013 [Temporary Landscapes] space99, Seoul
Group Exhibitions
2015 [Peace, Voice, Nic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2015 [Minima Moralia] Irkutsk National Museum, Irkutsk, Russia
2015 [The birth of the scene] Gallery LUX, Seoul
2014 [Why we can`t see the far side of the Moon?] The Texas Project, Seoul
2014 [Undead] Artspace IPO, Seoul
2014 [Seoul luna photo Festival] Artspace Boan, Seoul
2014 [A Gallery for 4 Hours and 16 Minut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Gwanghwamun, Seoul
2014 [Living Miryang] Gallery Ryugaheon, Seoul
2014 [Miryang_The Secret Sight] the Gallery Parking Lot in Saram, Seoul
2013 [Owing to the Light] Gallery Ryugaheon, Seoul
2013 [Continuation_Tie] Iang Gallery, Seoul
2012 [Drifting Images] Makii Masaru Fine Arts, Tokyo, Japan
2012 [Take Left] Gallery Now, Seoul
2010 [Asian Contemporary Photography] A.M Galley, Brighton, U.K
2010 [Potraitless portrait] Phototelling, Seoul
2010 [The 11th Annual Critic’s Choice Gallery] Gallery Illum, Seoul
Miscellaneous
2014 [2014 Baikal Nomadic Residency Program] , Arts Council Korea
2013 [Peacemuseum 2013 Artist’s Competition] Chosen, Peacemuseum
2009 [The 11th Annual Critic’s Choice] Awarded, Photospace
Individual Exhibitions
2015 [Last nights] Space O’NewWall, Seoul
2014 [Crimson, Green] space99, Seoul
2013 [Temporary Landscapes] space99, Seoul
Group Exhibitions
2015 [Peace, Voice, Nic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2015 [Minima Moralia] Irkutsk National Museum, Irkutsk, Russia
2015 [The birth of the scene] Gallery LUX, Seoul
2014 [Why we can`t see the far side of the Moon?] The Texas Project, Seoul
2014 [Undead] Artspace IPO, Seoul
2014 [Seoul luna photo Festival] Artspace Boan, Seoul
2014 [A Gallery for 4 Hours and 16 Minut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Gwanghwamun, Seoul
2014 [Living Miryang] Gallery Ryugaheon, Seoul
2014 [Miryang_The Secret Sight] the Gallery Parking Lot in Saram, Seoul
2013 [Owing to the Light] Gallery Ryugaheon, Seoul
2013 [Continuation_Tie] Iang Gallery, Seoul
2012 [Drifting Images] Makii Masaru Fine Arts, Tokyo, Japan
2012 [Take Left] Gallery Now, Seoul
2010 [Asian Contemporary Photography] A.M Galley, Brighton, U.K
2010 [Potraitless portrait] Phototelling, Seoul
2010 [The 11th Annual Critic’s Choice Gallery] Gallery Illum, Seoul
Miscellaneous
2014 [2014 Baikal Nomadic Residency Program] , Arts Council Korea
2013 [Peacemuseum 2013 Artist’s Competition] Chosen, Peacemuseum
2009 [The 11th Annual Critic’s Choice] Awarded, Photo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