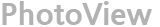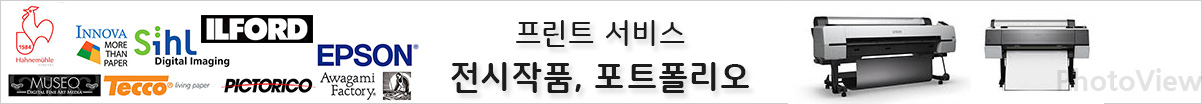작가 신유섭의 [양은(洋銀)]전이 갤러리 누다(NUDA)에서 열립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산업화의 거센 파고, 그 격변의 세월 속에서 우리네 서민들은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로, 얼큰한 찌개 한 냄비로,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로 서로를 보듬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훈훈한 위로의 현장, 삶의 한 가운데에는 언제나 양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담고 있는 내용물에 주인공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서민들의 체온과 맞 닿아있던 양은.
이제 작가 신유섭의 사진 속에서 양은은 아주 담백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과거 우리네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안은 채 주인공이 됩니다.
작가 신유섭의 [양은(洋銀)]전이 갤러리 누다(NUDA)에서 열립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산업화의 거센 파고, 그 격변의 세월 속에서 우리네 서민들은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로, 얼큰한 찌개 한 냄비로,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로 서로를 보듬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훈훈한 위로의 현장, 삶의 한 가운데에는 언제나 양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담고 있는 내용물에 주인공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서민들의 체온과 맞 닿아있던 양은.
이제 작가 신유섭의 사진 속에서 양은은 아주 담백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과거 우리네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안은 채 주인공이 됩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산업화의 거센 파고, 그 격변의 세월 속에서 우리네 서민들은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로, 얼큰한 찌개 한 냄비로,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로 서로를 보듬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훈훈한 위로의 현장, 삶의 한 가운데에는 언제나 양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담고 있는 내용물에 주인공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서민들의 체온과 맞 닿아있던 양은.
이제 작가 신유섭의 사진 속에서 양은은 아주 담백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과거 우리네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안은 채 주인공이 됩니다.
노동의 감성, 양은의 미학
제민(자유기고가)
사람들은 요즘을 ‘힐링(healing) 시대’라고 한다. 이 전에는 ‘웰빙(well-being)시대’라고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6.25 전쟁 직후 이 시대를 자의적으로 표현하자면 ‘리빙(living)시대’가 아닐까 싶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없어져버린 그 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했던 시대의 생존력에 대한 존경의 의미다. 조부모님이 살아온 리빙시대를 기반으로 부모님이 웰빙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힐링시대를 살고 있다.
6.25전쟁 이후, 더욱 가난해진 서민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에서 가마솥을 사용할 수 없던 그 때, 생활에 양은이 들어왔다. 특별한 관리 없이도 오래 쓸 수 있는 양은 제품은 가볍고 실용적이었다. 대량생산으로 인해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양은은 냄비에서 그릇, 쟁반, 세수대야까지 온갖 모양으로 쏟아져 나왔고, 생활 살림은 양은제품으로 채워졌다. 그야말로 가난했던 서민들 살림의 필수품이었다. 마치 이 시기의 양은제품은 서민 경제를 이끌 운명이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식료품, 농업용품, 의료품, 그리고 제당, 제분 같은 소비재 산업의 원료를 원조 받았다. 이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발전사의 수순대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시작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힘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신발, 가발, 섬유 공장이 들어섰다. 당시를 거쳐온 엄마들에게서 가발이나 면직물 공장에서 일한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쟁으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쏟아져 나온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국민의 ‘노동’으로 60년대 경제를 일궈냈다고 해도 무리될 말은 아니었다. 이 혼란과 건설의 시기에 양은제품이 생활에 녹아 들었다. 그래서인지 양은제품은 ‘고된 노동’의 상징이 됐다. 어딘가 움푹 패여 찌그러진 양은제품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농촌의, 공사장의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일까.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그 때, 모든 국민이 어떻게든 살아보자 애썼던 그 날의 소망이 담긴 듯 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에 첫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금의 도시 모습이 70년대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보다 제법 먹고 살만 해 지니 스테인리스가 양은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양은제품보다 무겁긴 했으나 쉽게 찌그러지지 않았고, 겉면이 반짝 반짝 한 것이 집들이 손님들에게 내보이기에도 제법 그럴 싸 했다.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활 물품의 재료도 점점 다양해졌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도자기와 유리 제품이 생활에 들어왔고, 이제는 겉으로 봐서는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도 모를 제품들이 생활 곳곳에 퍼져있다.
수많은 용기들의 등장에도 라면은 양은냄비에 먹어야 제 맛이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계란 하나 툭 깨어 넣고 냄비뚜껑에 면을 얹어 먹는 것은 ‘진리’로 통한다. 과학적으로 양은냄비로 요리한 밥과 라면이 스테인리스로 요리한 것보다 맛있다고 증명됐으니 단지 더 맛있다고 느끼는 ‘기분’만이 아니다. 사실 20대나 30대는 양은냄비나 양은 제품들을 거쳐 온 세대가 아니다. 오래된 양은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를 마시고 양은 냄비에 끓인 찌개는 오히려 5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양푼 라면’, ‘양푼 비빔밥’, ‘양푼 찌개’ 같이 양은냄비에 담긴 메뉴들은 매우 인기가 있다. 그 이유는 양은이 가진 그러한 호소력에 있다고 본다.
하얀 바탕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냄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이것이 양은인지 아닌 지도 알아보기 힘들다. 간신히 실루엣만을 드러내 놓고 초연하게 있는 모양새가 꼭 영정 사진 같기도 하다.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양은냄비를 꺼내어 보여주시며 ‘이게 30년도 더 된 냄비야’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서 “원래 밥은 전기밥솥보다 양은냄비에 지은 것이 훨씬 맛있다’고 하셨다. 아직도 그 냄비가 할머니 댁 주방 한켠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 나이도 마흔을 넘어 쉰을 바라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 냄비를 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은 미련이나 집착,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토록 고되게 살았던 그 날의, 찌개 하나로 심신을 달래던 과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빠르게 달려와 이제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하는 과거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이 남아있다.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은 이 양은 사진처럼 우리의 경제사 속에서 ‘고된 노동’이 일궈낸 그 기적을 점점 잊어가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양은주전자에 담긴 막걸리를 찾는 것은 사실 ‘힐링시대’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힐링을 받지 못하는 요즘, 작은 위안을 찾고 싶기 때문이 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나 또한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습관처럼 그 양은냄비를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제민(자유기고가)
사람들은 요즘을 ‘힐링(healing) 시대’라고 한다. 이 전에는 ‘웰빙(well-being)시대’라고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6.25 전쟁 직후 이 시대를 자의적으로 표현하자면 ‘리빙(living)시대’가 아닐까 싶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없어져버린 그 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했던 시대의 생존력에 대한 존경의 의미다. 조부모님이 살아온 리빙시대를 기반으로 부모님이 웰빙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힐링시대를 살고 있다.
6.25전쟁 이후, 더욱 가난해진 서민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에서 가마솥을 사용할 수 없던 그 때, 생활에 양은이 들어왔다. 특별한 관리 없이도 오래 쓸 수 있는 양은 제품은 가볍고 실용적이었다. 대량생산으로 인해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양은은 냄비에서 그릇, 쟁반, 세수대야까지 온갖 모양으로 쏟아져 나왔고, 생활 살림은 양은제품으로 채워졌다. 그야말로 가난했던 서민들 살림의 필수품이었다. 마치 이 시기의 양은제품은 서민 경제를 이끌 운명이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식료품, 농업용품, 의료품, 그리고 제당, 제분 같은 소비재 산업의 원료를 원조 받았다. 이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발전사의 수순대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시작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힘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신발, 가발, 섬유 공장이 들어섰다. 당시를 거쳐온 엄마들에게서 가발이나 면직물 공장에서 일한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쟁으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쏟아져 나온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국민의 ‘노동’으로 60년대 경제를 일궈냈다고 해도 무리될 말은 아니었다. 이 혼란과 건설의 시기에 양은제품이 생활에 녹아 들었다. 그래서인지 양은제품은 ‘고된 노동’의 상징이 됐다. 어딘가 움푹 패여 찌그러진 양은제품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농촌의, 공사장의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일까.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그 때, 모든 국민이 어떻게든 살아보자 애썼던 그 날의 소망이 담긴 듯 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에 첫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금의 도시 모습이 70년대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보다 제법 먹고 살만 해 지니 스테인리스가 양은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양은제품보다 무겁긴 했으나 쉽게 찌그러지지 않았고, 겉면이 반짝 반짝 한 것이 집들이 손님들에게 내보이기에도 제법 그럴 싸 했다.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활 물품의 재료도 점점 다양해졌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도자기와 유리 제품이 생활에 들어왔고, 이제는 겉으로 봐서는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도 모를 제품들이 생활 곳곳에 퍼져있다.
수많은 용기들의 등장에도 라면은 양은냄비에 먹어야 제 맛이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계란 하나 툭 깨어 넣고 냄비뚜껑에 면을 얹어 먹는 것은 ‘진리’로 통한다. 과학적으로 양은냄비로 요리한 밥과 라면이 스테인리스로 요리한 것보다 맛있다고 증명됐으니 단지 더 맛있다고 느끼는 ‘기분’만이 아니다. 사실 20대나 30대는 양은냄비나 양은 제품들을 거쳐 온 세대가 아니다. 오래된 양은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를 마시고 양은 냄비에 끓인 찌개는 오히려 5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양푼 라면’, ‘양푼 비빔밥’, ‘양푼 찌개’ 같이 양은냄비에 담긴 메뉴들은 매우 인기가 있다. 그 이유는 양은이 가진 그러한 호소력에 있다고 본다.
하얀 바탕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냄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이것이 양은인지 아닌 지도 알아보기 힘들다. 간신히 실루엣만을 드러내 놓고 초연하게 있는 모양새가 꼭 영정 사진 같기도 하다.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양은냄비를 꺼내어 보여주시며 ‘이게 30년도 더 된 냄비야’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서 “원래 밥은 전기밥솥보다 양은냄비에 지은 것이 훨씬 맛있다’고 하셨다. 아직도 그 냄비가 할머니 댁 주방 한켠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 나이도 마흔을 넘어 쉰을 바라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 냄비를 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은 미련이나 집착,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토록 고되게 살았던 그 날의, 찌개 하나로 심신을 달래던 과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빠르게 달려와 이제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하는 과거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이 남아있다.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은 이 양은 사진처럼 우리의 경제사 속에서 ‘고된 노동’이 일궈낸 그 기적을 점점 잊어가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양은주전자에 담긴 막걸리를 찾는 것은 사실 ‘힐링시대’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힐링을 받지 못하는 요즘, 작은 위안을 찾고 싶기 때문이 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나 또한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습관처럼 그 양은냄비를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