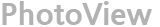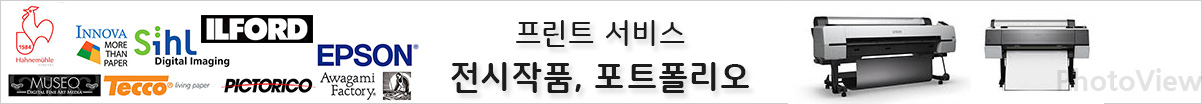나는 길위에 서있었다. 내가 그곳을 찾았고, 보고 싶고 확인해야하는 마음에 계속 거닐었다. 낯선 곳이 였다가도 다시금 익숙해지는 그곳이 나를 찾았다. 아니 내가 찾았다.
잊어보려 다가도 기억해내서 마음이 일렁이는 가지들이 떠올랐다. 나는 자연스레 사라졌다가 지워진다. 내가 하는 행위인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가물가물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파편이 떨어진다. 그제야 나는 사라지지 않고 기억은 마음대로 흘러버린다.
이상하게도 지긋이 쳐다보는 것이 좋다. 잠깐이여도 내 눈에 남는 것이 따듯했다. 보다 보다보니 징하게 질리는 게 낫겠다 싶었다. 눈에 남으면 마음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했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였다. 그러니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익숙한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일 것이라.
내부에 여러 겹의 비밀을 품은, 굴절된 풍경들
- 허란 사진전 <꺾인 풍경> 2월 27일부터 류가헌에서풍경은 바라다보는 관자의 심상에 의해서 ‘굴절’된다. 풍경이 현실 그대로 눈을 통해 마음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경을 비틀고 왜곡한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찍는 이의 심상에 따라서도 풍경은 바뀐다. 그렇게 사진가의 심상이 반영된 사진 속 풍경은, 그 사진을 바라보는 관자의 심상과는 다시 어떻게 조우할까.
여기 있는 일련의 사진들은 ‘잔잔한 바다’ ‘나무숲 위의 초승달’ ‘수평선을 바라보는 아이들’ 등 몇 개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하다. 특별히 극적인 느낌도 없이 고요하고 담담한 사진들이다.
그런데도 바라다보면 마음에 묘한 파장이 인다. 마치 벽지를 뜯어내듯 풍경의 껍질을 한 꺼풀 벗겨내면 그 내부에 여러 겹의 비밀이나 어떤 내력이 담겨 있을 것만 같다. 그냥 ‘잔잔한 바다’ ‘나무 숲 위의 초승달’ ‘수평선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딘지 아슬아슬하면서 아득하다. 작가의 심상에 의해 굴절된 풍경, 즉 <꺾인 풍경>이다.
이 사진들을 찍은 젊은 사진가 허란은 수년 간 ‘젊은 사진가’라는 의무감을 지니고 여러 ‘현장’들을 맴돌았다. 분노와 함성이 가득 찬 시위 현장, 투쟁이 뒤섞인 노동 현장, 무언가를 무참히 부수고 올라서는 건설 현장 등등 사건과 사람들, 무수한 말들의 현장 속에 스스로를 두었다. 광화문부터 밀양과 강정까지 자주 여러 현장에서 목도되다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 ‘현장 사진가’라는 수식이 붙어있었다.
그런데, 한때 신문매체에 적을 두어 ‘허란 기자’라는 호칭까지 지닌 그녀의 시선은 늘 현장의 치열함이나 거대함에 가닿지 않고 빗나갔다. 객관성이나 사실성에 중심을 둔 기록 사진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중해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아도 시선이 빗나가기는 마찬가지였다.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바람에 요동치는 나무에게로, 세월호가 잠겨있는 동거차도에서는 희미하게 뜬 초승달로, 일본 오키나와의 전쟁 추모비 앞에서는 해안바위 위에서 뛰노는 교복 차림의 어린 학생들에게로...
때로는 그녀의 심상에 기록되어 있던 ‘어떤 현장’이 전혀 다른 시공의 풍경에 느닷없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바라보고 있는 수평선에 초점이 맞춰져 흐릿하게 보이는 아이들의 뒷모습은, 전혀 다른 시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에게까지 그 ‘어떤 현장’의 통각을 그대로 전달한다.
허란의 첫 번째 개인전 <꺾인 풍경>은 바로 이렇게, 그녀만의 방식으로 찍은 굴절된 현장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전시는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갤러리 류가헌 전시 1관에서 열린다.
나는 길위에 서있었다. 내가 그곳을 찾았고, 보고 싶고 확인해야하는 마음에 계속 거닐었다. 낯선 곳이 였다가도 다시금 익숙해지는 그곳이 나를 찾았다. 아니 내가 찾았다.
잊어보려 다가도 기억해내서 마음이 일렁이는 가지들이 떠올랐다. 나는 자연스레 사라졌다가 지워진다. 내가 하는 행위인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가물가물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파편이 떨어진다. 그제야 나는 사라지지 않고 기억은 마음대로 흘러버린다.
이상하게도 지긋이 쳐다보는 것이 좋다. 잠깐이여도 내 눈에 남는 것이 따듯했다. 보다 보다보니 징하게 질리는 게 낫겠다 싶었다. 눈에 남으면 마음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했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였다. 그러니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익숙한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일 것이라.
잊어보려 다가도 기억해내서 마음이 일렁이는 가지들이 떠올랐다. 나는 자연스레 사라졌다가 지워진다. 내가 하는 행위인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가물가물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파편이 떨어진다. 그제야 나는 사라지지 않고 기억은 마음대로 흘러버린다.
이상하게도 지긋이 쳐다보는 것이 좋다. 잠깐이여도 내 눈에 남는 것이 따듯했다. 보다 보다보니 징하게 질리는 게 낫겠다 싶었다. 눈에 남으면 마음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했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였다. 그러니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익숙한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일 것이라.
허란 Heo Ran
1988. 1. 19 서울 출생
그룹전
2012 [소금 빚다] 상명대 사진영상미디어 졸업전시, 서울
2014 [밀양을 살다]_류가헌 갤러리
2014 [우리 시대의 빛] 기륭빌딩
2014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 문화 예술의 전당
2015 [아이들의 빈 방] 안산 416기억저장소, (1주기 추모전) 광화문 광장
2015 [장님 코끼리 만지듯] 지금 여기 갤러리
2016 [2016 한국-오키나와 사진 교류전] 오키나와 라파엘트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