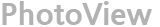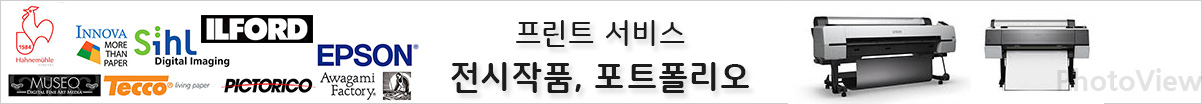초기 작업에서 드로잉 작업을 주로 선보였던 염소진은 이번 개인전에서 몇 년 동안 매해 같은 방식으로 친구를 잃었던 경험을 설치와 영상을 통해 풀어 놓는다. 관람객이 처음 만나게 되는 <너와 나의 거리>는 핸드폰 영상을 바라보는 군상의 이미지로, 무의식적으로 액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디지털로 세상의 소통은 가까워졌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어버린 상황을 직감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싱글채널 비디오 [Train Rt4]는 이번 전시에서 보이는 신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기차역을 배경삼아 그 곳에서 한 인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만남과 헤어짐을 은유한다. 작가는 [Train Rt4]에서 친구를 만났던 기억,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과정과 그 느낌을 일기처럼 담담히 내려쓴다. 한동안 비통에 잠기고, 원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작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 깊이 상념한다.
전시장 뒤편으로 설치된 <분리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는 작가가 살아온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오브제, 알약, 모래시계, 바늘 등등의 개인의 과거사와 관련된 물건들을 물풀에 뒤섞고 수분이 다 빠져서 쪼그라든 설치 작업을 높이 세워, 훼손되어버리고 과거에 묻힌 기억들을 다시 기념하는 슬픈 기념비적 작업이다.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들을 오브제에 꾹꾹 눌러담으며, 자살이 선택이 아니라 집단으로부터 강요된 결과라는 점에 작업을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유사한 위험에 내몰린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또한 <실격>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그녀는 이러한 상황인식에 대해서 모호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고백적인 성찰에 가까운 작업들로 작업들 간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지금 이 과정이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초기 작업에서 드로잉 작업을 주로 선보였던 염소진은 이번 개인전에서 몇 년 동안 매해 같은 방식으로 친구를 잃었던 경험을 설치와 영상을 통해 풀어 놓는다. 관람객이 처음 만나게 되는 <너와 나의 거리>는 핸드폰 영상을 바라보는 군상의 이미지로, 무의식적으로 액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디지털로 세상의 소통은 가까워졌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어버린 상황을 직감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싱글채널 비디오 [Train Rt4]는 이번 전시에서 보이는 신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기차역을 배경삼아 그 곳에서 한 인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만남과 헤어짐을 은유한다. 작가는 [Train Rt4]에서 친구를 만났던 기억,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과정과 그 느낌을 일기처럼 담담히 내려쓴다. 한동안 비통에 잠기고, 원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작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 깊이 상념한다.
전시장 뒤편으로 설치된 <분리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는 작가가 살아온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오브제, 알약, 모래시계, 바늘 등등의 개인의 과거사와 관련된 물건들을 물풀에 뒤섞고 수분이 다 빠져서 쪼그라든 설치 작업을 높이 세워, 훼손되어버리고 과거에 묻힌 기억들을 다시 기념하는 슬픈 기념비적 작업이다.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들을 오브제에 꾹꾹 눌러담으며, 자살이 선택이 아니라 집단으로부터 강요된 결과라는 점에 작업을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유사한 위험에 내몰린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또한 <실격>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그녀는 이러한 상황인식에 대해서 모호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고백적인 성찰에 가까운 작업들로 작업들 간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지금 이 과정이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전시장 뒤편으로 설치된 <분리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는 작가가 살아온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오브제, 알약, 모래시계, 바늘 등등의 개인의 과거사와 관련된 물건들을 물풀에 뒤섞고 수분이 다 빠져서 쪼그라든 설치 작업을 높이 세워, 훼손되어버리고 과거에 묻힌 기억들을 다시 기념하는 슬픈 기념비적 작업이다.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들을 오브제에 꾹꾹 눌러담으며, 자살이 선택이 아니라 집단으로부터 강요된 결과라는 점에 작업을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유사한 위험에 내몰린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또한 <실격>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그녀는 이러한 상황인식에 대해서 모호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고백적인 성찰에 가까운 작업들로 작업들 간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지금 이 과정이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몇 년 사이 매해 같은 방식으로 친구를 잃었다. 한동안 비통에 잠긴 나는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동시에 남겨진 사람으로서 까닭 모를 죄의식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시간동안 나는 불현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거두는 행위란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해한 바로는 자살이란 어느 개인이 사회적 고립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 또는 자기결정권이다. 한편으로는 제도화되지 못한 구성원 중 일부가, 내부에서 외부로 혹은 영원히 외부만을 겉 돌다 사라지는 이방인들의 결핍이 낳은 유물론적 결과이다. 나의 생각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자살은 사회적이다. 개인이 선택하지만 집단으로부터 강요된다. 따라서 나의 부재가 사회적 의미로부터 요구받아진 것이라면 나는 그것(집단성)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 것인가? 내외의 벽이 불분명한 지금, 나와 그들 모두가 유사한 위험에 내몰린 구조 속에서 어쩌면 먼저 간 우리였을 그들이 선택했던 비극적 생의 종착역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눈물이 눈을 가리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앞을 보려 눈물을 서둘러 거둔다면 그 눈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
- 눈물이 눈을 가리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앞을 보려 눈물을 서둘러 거둔다면 그 눈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