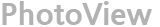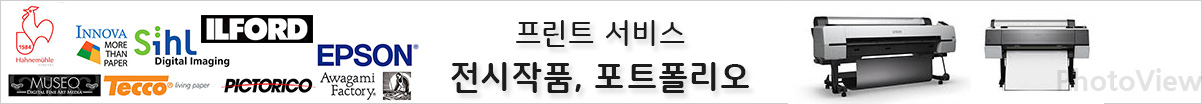바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장소다. 특히, 동해 바다는 각종 기암괴석과 천혜의 경관을 가진 명소로 알려져 있는 최고의 해변 관광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적, 물리적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군사시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통제했던 군 초소와 철책선은 강제된 안보의 표상으로 해안의 출입과 조망을 제한하고 있다. 이 장치들은 북쪽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통일 전망대에서부터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그리고 지난한 시간을 간직한 채, 수 십 년 동안 우리의 의식과 일상에서 심리적, 정서적인 거리를 조율하며 삶과 의식에 깊숙히 뿌리 내리고 있다.
해안의 경계선 주변은 군사지대와 일상의 공간이 중첩되는 곳에 많아 그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적인 일몰과 일출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 경계가 나뉘어지기도 한다. 해를 거듭할 수록 관광지로 이름난 해변에는 경계선인 철책이 걷어지고 군 초소가 사라져 더 이상 출입의 제한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곳은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변을 찾는 사람들은 군사용 구조물이나 물리적 경계선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단지, 심리적 긴장과 물리적 불편을 주는 존재로 여기거나 고정된 울타리 형식의 조형물 정도로 생각하며 크게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색다른 구조물을 찾은 것처럼 신기해 하며 관광지의 기념물을 구경하듯 사진을 찍으며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고 있다. 오랫동안 경계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 더 이상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리적 장치들이 갖는 의미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념의 표상으로 자리 잡은 철책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계인지? 구분짓기 어려운 경계는 무엇을 위한 경계인지? 작업 내내 고민과 물음으로 혼란스러웠다. 이곳의 경계는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숲 너머, 해변을 따라 철책선이 길게 이어져 있는 동해안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김 전 기 -
Borderline
“다양한 층위가 공존하는 경계선상의 풍경은 그 시선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유의 도구로 작동하게 했다.”
4월 B.CUT 비컷 갤러리는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을 2007년부터 촬영한 김전기 작가의 작업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십여 년 간 작가의 시선은 고집스럽게 경계선상의 풍경(Borderline Scenery)에 천착했다. 하지만 그 시선은 풍경을 바라보는 시각적 인식으로만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유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사유를 촉발시켰던 풍경의 층위를 살펴보면서 바라봄 너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제안한다. 그 층위를 보게 되면 우선, 땅과 바다가 공존하는 해안선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선상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외에도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계절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한 장면도 경계선상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연출한다. 물론 이 단순한 장치는 어느 해변을 촬영해도 재연 가능하다. 그렇다면 작가가 흥미롭게 보았던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펼쳐지는 해안은 어떤가, 작가는 그곳에서만 조망 가능한 구별된 풍경을 가진 해변의 길이가 휴전선의 길이와 같은 155마일이라고 한다. (작가는 2014년 ”155 miles” 이란 전시명으로 전시를 하였다) 철책과 군사 시설로 민간인 통제 지역을 구획했던 정치적 풍경은 분단 50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일상의 삶도 혼재된 이질적 풍경으로 바뀌어 갔다. 철책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 특이한 조형물이 되어버린 오래된 초소, 해제된 군사지역에 들어온 상업 시설 등, 이 낯섦은 작가의 시선을 획득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다. 물리적 경계가 무너진 곳을 비집고 들어온 자본과 인간의 욕망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그곳에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순응하는 인물로 등장하면서 심리적 경계선상의 풍경도 덧씌워진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가 공존하는 풍경은 바라본다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유를 작가에게 요구하였고,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작가의 시선을 따라 보게 되는 경계선상의 풍경은 우리에게도 시각적 인식 태도를 결정짓는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 질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도 보지 못했던 현실을 재인식하고 의심하며 답을 찾아갈 거라 기대한다.
– 비컷 갤러리 –
바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장소다. 특히, 동해 바다는 각종 기암괴석과 천혜의 경관을 가진 명소로 알려져 있는 최고의 해변 관광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적, 물리적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군사시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통제했던 군 초소와 철책선은 강제된 안보의 표상으로 해안의 출입과 조망을 제한하고 있다. 이 장치들은 북쪽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통일 전망대에서부터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그리고 지난한 시간을 간직한 채, 수 십 년 동안 우리의 의식과 일상에서 심리적, 정서적인 거리를 조율하며 삶과 의식에 깊숙히 뿌리 내리고 있다.
해안의 경계선 주변은 군사지대와 일상의 공간이 중첩되는 곳에 많아 그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적인 일몰과 일출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 경계가 나뉘어지기도 한다. 해를 거듭할 수록 관광지로 이름난 해변에는 경계선인 철책이 걷어지고 군 초소가 사라져 더 이상 출입의 제한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곳은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변을 찾는 사람들은 군사용 구조물이나 물리적 경계선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단지, 심리적 긴장과 물리적 불편을 주는 존재로 여기거나 고정된 울타리 형식의 조형물 정도로 생각하며 크게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색다른 구조물을 찾은 것처럼 신기해 하며 관광지의 기념물을 구경하듯 사진을 찍으며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고 있다. 오랫동안 경계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 더 이상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리적 장치들이 갖는 의미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념의 표상으로 자리 잡은 철책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계인지? 구분짓기 어려운 경계는 무엇을 위한 경계인지? 작업 내내 고민과 물음으로 혼란스러웠다. 이곳의 경계는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숲 너머, 해변을 따라 철책선이 길게 이어져 있는 동해안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김 전 기 -
해안의 경계선 주변은 군사지대와 일상의 공간이 중첩되는 곳에 많아 그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적인 일몰과 일출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 경계가 나뉘어지기도 한다. 해를 거듭할 수록 관광지로 이름난 해변에는 경계선인 철책이 걷어지고 군 초소가 사라져 더 이상 출입의 제한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곳은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변을 찾는 사람들은 군사용 구조물이나 물리적 경계선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단지, 심리적 긴장과 물리적 불편을 주는 존재로 여기거나 고정된 울타리 형식의 조형물 정도로 생각하며 크게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색다른 구조물을 찾은 것처럼 신기해 하며 관광지의 기념물을 구경하듯 사진을 찍으며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고 있다. 오랫동안 경계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 더 이상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리적 장치들이 갖는 의미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념의 표상으로 자리 잡은 철책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계인지? 구분짓기 어려운 경계는 무엇을 위한 경계인지? 작업 내내 고민과 물음으로 혼란스러웠다. 이곳의 경계는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숲 너머, 해변을 따라 철책선이 길게 이어져 있는 동해안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김 전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