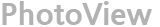약 력
강원 태백 출생
강원관광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삼천 원짜리 국수장사를 30년을 해온 사람이나 한 끼 식사를 삼천 원 주고 먹는 사람에게나 삼천 원은 절대 수치인 것이다. 삼천 원을 받아서 떼돈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을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삼천 원을 주고 사먹는 식사는 허기를 면해주고 나름 서민생활의 구수한 정취를 느끼게 하지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정찬에서 즐기는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인생의 성취감 같은 것은 느끼지 못 할 것이다. 낡고 허름한 구둣방 진열장에 먼지를 뒤집어 쓴 신사구두 한 켤레에 팔만오천원인데 5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그가 3일을 작업 한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이것은 언제 팔릴지도 모른다. 왜 우리는 서민들의 직업에서 만이 눈물겨운 투명성을 볼 수 있는 것일까? 천원어치 붕어빵을 사면서, 혹은 이천 원짜리 두부 한 모를 사면서 그들에게 모델을 서 줄 것을 간청했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 장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뜨거운 국 사발을 나르는 늙은 주인장 앞에서 단 2초의 시간을 할애 받는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지체 할 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물이 식을까봐, 국수가 부르틀까봐 걱정을 한다. 나에게도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삶의 명분이 있을까?
어떤 장사꾼이든 장사를 취미나 재미로 하는 사람은 없다. 이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를 걸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투쟁을 한다. 카메라 앞에 선 이들의 표정 속에는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네요." 하는 것과 "이것 한 번 드셔봐요"하는 것과 "아이고, 나 참, 쑥스럽네요."하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있다. 이것은 개개인의 각기 다른 표정이라기보다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깊은 속내가 섞여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임실 강진장날 머리에 보따리를 인 할머니를 만나 사진을 찍다가 이야기가 길어졌다. 겉보리와 옥수수를 이고 와서 뻥튀기를 하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저녁나절까지 어디서 기다려야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다. 겨울의 시골 장터는 띄엄띄엄 장꾼들이 전을 열고 있지만 바람은 난전의 천막을 휘갈기며 지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밥을 사먹을 생각도 않고 있었다. 애당초 점심값은 계획에 없는 듯했다. 나는 같이 국수나 사먹자고 권했다. 할머니는 처음 사양하더니 이네 보따리를 이고 따라왔다. 그이는 뜨거운 장터국수 국물을 마시며 “아, 맛있네!”하고 중얼거렸다. 양은 국수그릇을 움켜든 두 손은 손톱이 닳고 살결은 거칠었다. 삼천 원짜리 식사가 이런 것일 수도 있구나 하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번 작업은 우리 삶에서 쉽게 접근하는 서민생활의 기본적인 물가 단위가 얼마나 무겁거나 혹은 가벼운지, 지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각인되어지는 숫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체감하는 숫자는 세월이 지나면 어떤 무게로 기억 될지 알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민들이 삶의 무게며 단위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지연
삼 천 원의 식사
삼천 원짜리 국수장사를 30년을 해온 사람이나 한 끼 식사를 삼천 원 주고 먹는 사람에게나 삼천 원은 절대 수치인 것이다. 삼천 원을 받아서 떼돈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을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삼천 원을 주고 사먹는 식사는 허기를 면해주고 나름 서민생활의 구수한 정취를 느끼게 하지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정찬에서 즐기는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인생의 성취감 같은 것은 느끼지 못 할 것이다. 낡고 허름한 구둣방 진열장에 먼지를 뒤집어 쓴 신사구두 한 켤레에 팔만오천원인데 5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그가 3일을 작업 한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이것은 언제 팔릴지도 모른다. 왜 우리는 서민들의 직업에서 만이 눈물겨운 투명성을 볼 수 있는 것일까? 천원어치 붕어빵을 사면서, 혹은 이천 원짜리 두부 한 모를 사면서 그들에게 모델을 서 줄 것을 간청했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 장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뜨거운 국 사발을 나르는 늙은 주인장 앞에서 단 2초의 시간을 할애 받는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지체 할 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물이 식을까봐, 국수가 부르틀까봐 걱정을 한다. 나에게도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삶의 명분이 있을까?
어떤 장사꾼이든 장사를 취미나 재미로 하는 사람은 없다. 이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를 걸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투쟁을 한다. 카메라 앞에 선 이들의 표정 속에는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네요." 하는 것과 "이것 한 번 드셔봐요"하는 것과 "아이고, 나 참, 쑥스럽네요."하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있다. 이것은 개개인의 각기 다른 표정이라기보다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깊은 속내가 섞여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임실 강진장날 머리에 보따리를 인 할머니를 만나 사진을 찍다가 이야기가 길어졌다. 겉보리와 옥수수를 이고 와서 뻥튀기를 하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저녁나절까지 어디서 기다려야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다. 겨울의 시골 장터는 띄엄띄엄 장꾼들이 전을 열고 있지만 바람은 난전의 천막을 휘갈기며 지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밥을 사먹을 생각도 않고 있었다. 애당초 점심값은 계획에 없는 듯했다. 나는 같이 국수나 사먹자고 권했다. 할머니는 처음 사양하더니 이네 보따리를 이고 따라왔다. 그이는 뜨거운 장터국수 국물을 마시며 “아, 맛있네!”하고 중얼거렸다. 양은 국수그릇을 움켜든 두 손은 손톱이 닳고 살결은 거칠었다. 삼천 원짜리 식사가 이런 것일 수도 있구나 하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번 작업은 우리 삶에서 쉽게 접근하는 서민생활의 기본적인 물가 단위가 얼마나 무겁거나 혹은 가벼운지, 지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각인되어지는 숫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체감하는 숫자는 세월이 지나면 어떤 무게로 기억 될지 알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민들이 삶의 무게며 단위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지연
김지연의 사진집을 읽어가는 동안 나는 내 몸에서 나의 국과 밥이 얼마나 멀리 사라져버렸다가 겨우 겨우 길을 찾아 돌아오고 있는지를 아프도록 오래 경험해야만 했다. 아직은 우리 곁에 남아 있지만 점점 외곽으로 밀리면서 사라져 가는 ‘삼천 원의 식사’들. 매끼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밥 먹는 일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다고 잘라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먹고자 꿈꾸는 밥이 더 이상 ‘삼천 원의 식사’는 아니며 그 밥을 먹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또한 옛날과는 서로 다른 마음이리라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김지연은 ‘삼천 원의 식사’를 데리고 먼 길을 돌아 우리에게 되짚어 오지 않았을까. 때로는 사골 떡만두국이나 소머리국밥, 어묵우동이나 김치수제비를 들고 오기도 하고, 팥죽을 끓이거나 국수를 삶아서 쟁반에 곱게 받쳐 들고 올 때도 있다. 삶은 국수가닥을 찬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에 둘둘 말아서 입에 덥석 넣어주고는 어린 시절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뜨거운 것을 끓여내던 어두컴컴한 부엌으로 우리를 성큼 데려가기도 한다. 따라서 ‘삼천 원의 식사’는 꼭 삼천 원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꼬막 한 되 털신 한 켤레로 그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황석어젓 한 바가지나 나무줄기를 파들어 갈 목도장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르면 ‘삼천 원의 식사’는 드디어 단순한 밥을 넘어서서 이제는 쫓겨 사라져가야 할 사람들의 애타는 땀과 소박한 꿈으로 그 의미망을 넓혀 나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자본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땀과 밥과 꿈과 돈에 관한 소박한 기억들을 인간의 총체적인 그리움으로 살려내겠다는 작정을 하고 있으며,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땀과 밥과 꿈과 돈의 욕망들을 향해 솔직담백한 맨 얼굴로 되묻고 있다. 도대체 얼마치의 꿈을 꾸기 위해 우리는 밥을 먹고 있으며 삼천 원은 어떤 가치와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기에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져가야 하는 가를. 그러나 작가는 그 자신이 그동안 천착해 온, ‘사라지는 것’의 중심부에 놓여 있었던 민중들의 삶’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끝내 드러내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만 열중하려고 애를 쓴다. 삶의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이어진 인간의 그리움을 기억 안에서 살려내는 일이 행여 자신의 목소리로 인해 훼손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는 사람처럼.-
김 영 춘(시인)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김지연은 ‘삼천 원의 식사’를 데리고 먼 길을 돌아 우리에게 되짚어 오지 않았을까. 때로는 사골 떡만두국이나 소머리국밥, 어묵우동이나 김치수제비를 들고 오기도 하고, 팥죽을 끓이거나 국수를 삶아서 쟁반에 곱게 받쳐 들고 올 때도 있다. 삶은 국수가닥을 찬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에 둘둘 말아서 입에 덥석 넣어주고는 어린 시절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뜨거운 것을 끓여내던 어두컴컴한 부엌으로 우리를 성큼 데려가기도 한다. 따라서 ‘삼천 원의 식사’는 꼭 삼천 원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꼬막 한 되 털신 한 켤레로 그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황석어젓 한 바가지나 나무줄기를 파들어 갈 목도장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르면 ‘삼천 원의 식사’는 드디어 단순한 밥을 넘어서서 이제는 쫓겨 사라져가야 할 사람들의 애타는 땀과 소박한 꿈으로 그 의미망을 넓혀 나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자본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땀과 밥과 꿈과 돈에 관한 소박한 기억들을 인간의 총체적인 그리움으로 살려내겠다는 작정을 하고 있으며,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땀과 밥과 꿈과 돈의 욕망들을 향해 솔직담백한 맨 얼굴로 되묻고 있다. 도대체 얼마치의 꿈을 꾸기 위해 우리는 밥을 먹고 있으며 삼천 원은 어떤 가치와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기에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져가야 하는 가를. 그러나 작가는 그 자신이 그동안 천착해 온, ‘사라지는 것’의 중심부에 놓여 있었던 민중들의 삶’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끝내 드러내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만 열중하려고 애를 쓴다. 삶의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이어진 인간의 그리움을 기억 안에서 살려내는 일이 행여 자신의 목소리로 인해 훼손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는 사람처럼.-
김 영 춘(시인)